
ⓒ 왕소희

ⓒ 왕소희
여행을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골랄끼도리아에서 만난 인연은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그 새로운 세계란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인도에서 만난 람과 지니는 나를 타인의 삶 속으로 여행하게 했다.
마을에 온지 얼마 안돼 지니는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가끔 나에게 물었다
"너, 남을 도와 본 적 없지?"
"응. 솔직히 난 다른 사람을 왜 도와야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머릿속에 이유가 안 떠오른 다구."
"이그… 쯧쯧쯧."
그녀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별명이 '오지랖 열두 폭' 일정도.
사람들과 섞여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과정은 나에게 찬사와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정말 입체적으로 동네사람들을 보살폈다. 그녀를 보면서 느낀 것은 돕는다는 건 뭔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동네 사람들을 좋아했다.
지니는 가끔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 그날은 한국 음식을 만들기로 했었다. 까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고깃국을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답례를 하기로 한 것이다. 고깃국이라고 해봐야 아무리 저어 봐도 국물에 파도만 일뿐 건더기라곤 없는 것이었지만. 지니는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그곳은 인도였으므로 인도식으로 만두를 빚기로 했다. 시금치를 삶아 넣고 빠니르(인도식 치즈)를 곱게 다져넣어 베개만한 왕만두를 빚었다. 그런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다. 시금치를 구하네, 삶을 물을 끓이네, 장작을 패네, 불을 지피네 하면서 시간이 흘렀다. 낮에 시작한 요리가 끝났을 무렵,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한편 부엌 그늘에는 요리 내내 지니를 노려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부엌 주인인 깔루 엄마였다. 그녀는 종일 화덕을 차지하고 있는 지니 때문에 화가 났다.
"언제까지 부엌을 쓸 거야!"
깔루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그녀의 시아버지인 까까 할아버지가 이를 막고 나섰다.
"얘야, 지니를 너무 나무라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잖니"
"하지만 기름도 물도 밀가루도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 왕소희
지니를 딸처럼 아끼던 까까 할아버지는 지니를 감쌌지만 결국 며느리를 이기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까까 할아버지는 집을 나가 버렸다. 지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를 찾으러 다녔다. 일주일 뒤 할아버지가 돌아왔다. 지니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까까 할아버지, 이제 집 나가지 말아요.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못 살아."
그리고 준비해두었던 꿀과 약을 내밀었다. 이번엔 까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지니는 또 대단한 술꾼이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밀주를 파는 집이 있었다. 인도에서 밀주는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밀주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낭패를 보게 된다고 들었다. 순리 바이삽은 매일 저녁 밀주를 사서 뱃속에 감추고 돌아왔다. 지니와 마시기 위해서였다. 봉지에 담겨진 술에선 독한 냄새가 났다. 화학 실험실의 선반에서 갓 꺼낸 듯한 냄새 때문에 나는 그 술을 마시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참 잘도 마셨다. 술을 마시면 지니는 외쳤다.
"람 냉야.엄마 냉야.(람도 없고 엄마도 없고) 삐요 삐요.(마셔 마셔)"
"암. 삐요 삐요.(마셔 마셔)"
순리 바이삽은 자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지니를 동생처럼 여겼다. 언젠가 동네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우리는 마을의 몇 집에 수고비를 주고 밥을 부탁해서 먹기도 했다. 그때 몇몇 아줌마들이 이 기회에 돈을 긁어내야겠다는 욕심을 내서 싸움이 난적이 있었다. 마음이 상한 우리는 밥을 먹지 않기로 하고 시내로 나가 버렸다. 이때 순리 바이삽이 우리를 찾아 왔다.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나도 안 먹을 거야. 우리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지니는 이번에도 눈물을 글썽거렸다.

ⓒ 왕소희
그녀는 동네 아이들도 잘 돌봤다. 씻기고 화장품을 발라주고 아픈 아이들을 챙겨 병원으로 보냈다. 치약, 비누, 신발 등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나눠주기도 했다. 심지어는 동네 개들의 벼룩까지 잡아주었다. 이 모든 일들은 지니가 정말로 그들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또 다른 한 명은 람이다. 람 또한 남을 돕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아이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그를 람 반장이라고 불렀다.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며 도저히 해 낼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을 해냈기 때문이다. 인도인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봐온 억울하고 가난한 인도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어 했다. 그 또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 왕소희
한번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았던 인도 여성이 학교를 찾아왔다. 오랜 해외생활을 한 그녀는 봉사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지긋한 나이에 인도를 방문했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지어진 이 학교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다. 아침 조회 시간에 아이들 앞에 앉은 그녀는 갑자기 우유를 한 잔 달라고 했다. 그런 곳에 우유가 있을 리 없었다. 가난한 동네라 소도 없어서 우유는 멀리서 사와야 했다.
"난 아침마다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단호한 그녀를 위해 멀리서 우유를 사다 날랐다. 한 잔의 우유. 모두가 그녀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 뽀얀 것을 들이켜던 그녀는 갑자기 람을 불렀다.
"당신은 너무 자신을 돌보지 않더군요. 남을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건강이 먼저지요. 한 번 마시고 줘요"
거의 강제적 권유에 컵을 받아든 그는 잠시 서있었다. 그러더니 줄을 지어 서 있는 아이들에게로 돌아섰다.
"자, 아 해"
그는 아이들 사이로 돌아다니며 그들의 입에 우유를 조금씩 나눠서 부어주었다. 아이들은 너무나 오랜만에 맛보는 고소함에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인도인인 그는 무엇보다 그들의 배고픔을 진심으로 이해했다.
배가 고프면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다. 그 마을에 살았던 나에게도 배고픈 기억이 있다. 시골에서 생활한지 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나의 건강상태는 최악이었다. 먹을 것이라곤 밥 뿐이었는데 그것도 늦은 아침과 저녁 두 끼였다. 게다가 짜파티(구운 밀떡)에 국물뿐인 사브지(야채커리)가 전부여서 먹어도 전혀 포만감이 들지 않았다.
늘 배가 고팠다. 그때 우리는 언덕위에 음악 쇼를 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매일 일을 하고 있었다. 머리꼭지를 모두 빨갛게 달궈 놓고 말겠다는 듯 이글대는 인도의 태양아래 나는 금세 까맣게 타버렸다. 익숙지 않은 햇볕은 우리를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르차 시내에 가게 됐다. 오랜만에 시내를 찾은 나는 삶은 계란이 무척 먹고 싶었다. 계란 집으로 바삐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메이!"
"어? 리게이!"
리게이는 내가 예전에 묵었던 호텔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메이,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그래? 너무 말랐어!"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너 지금 너무 까맣고 지저분해. 네가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고생하는구나."
한참을 안됐다는 듯 나를 바라보던 리게이는 내 손을 잡아끌고 계란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삶은 계란 20루피 어치(약 600원, 10개)를 사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계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너무 감동스러웠다.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인 그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서 나에게 계란을 사 준 것이다. 계란은 너무 맛있었다. 단순히 삶은 계란이었지만 정말로 천 가지 맛이 났다.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어!"
나는 감탄, 또 감탄하며 계란을 먹어치웠다. 계란을 먹고 나자 힘이 나면서 세상이 노른자의 고운 색처럼 아름답게만 보였다.
이제 나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작지만 이유를 붙일 수 있게 됐다.
"너, 남을 도와 본 적 없지?"하는 지니의 물음에 작은 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도 배고픈 걸 이해 해. 배고프면 좋은 생각이라곤 할 수없어"
나에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아직도 불편하고 낯선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배고픔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알 것 같았다.
사람들을 정말로 좋아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지니와 인도인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하는 람과 이제 갓 배고픔을 이해한 나는 좋은 친구들이었다. 골랄끼또리아. 이 작은 시골마을에서 만나진 우리들. 우리는 이 작은 마을의 자립을 위해 '오르차 채러티'라는 이름으로 함께 힘을 합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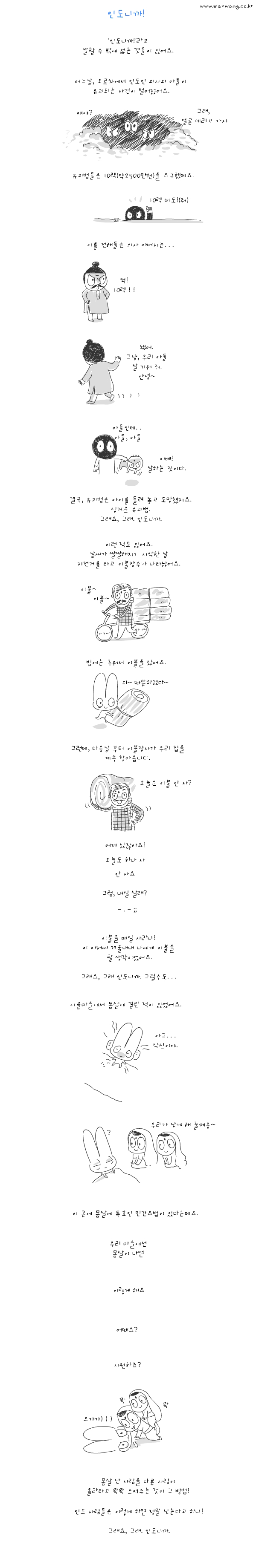
ⓒ 왕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