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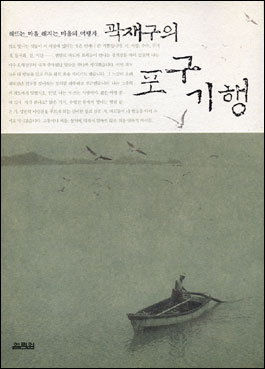 | | | ▲ <곽재구의 포구기행>, 곽재구 지음, 열림원, 2002 | | | ⓒ 열림원 | 사람을 한두 유형으로 가르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재미삼아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는 있겠다 싶다. 길 위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가고 싶은 곳이 많아 여행서를 읽는다. 아니, 가지 않은 곳이 많아 여행서를 읽는다. 여행서는 강퍅한 마음을 두드려 온기와 생기를 돌게 만든다. 딱딱한 북어를 두드려 시원하게 속을 푸는 북어국으로 변주해내는 방망이와도 같다.
그러나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버리기 위함’의 여정인 <반지의 제왕>이 관심을 끄는 것은 획득보다 상실, 소유보다 버림을 선택한 구도가 지닌 매혹 때문이다. 보다 적은 쪽으로의 향함, 그것은 홀로 하는 여행의 절대 명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여행자의 도반이고 싶을 때가 있다.
<곽재구의 포구기행>중에서 “모래사장이 끝나는 작은 바위섬에서 나는 이문재의 시집을 읽었다.”는 문장에서 그만 마음이 푹 젖고 말았다. 홀로 길 위에 있는 사람만이 시를 읽는다. 이때 시는 ‘길 위에서의 명상’이며, ‘명상으로의 길’이다.
인용시의 어떤 부분이 저자의 마음에 스미었을까. 책꽂이에서 그 시가 실린 시집 <마음의 오지>를 꺼낸다. 오랜만이다. 도심에 몸 붙어 있었으나 이문재의 마음은 오지를 떠돈다. 그의 마음이 오지다.
몸에서 나간 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언제 나갔는데 벌써 내 주소 잊었는가 잃었는가
그 길 따라 함께 떠난 더운 사랑들
그러니까 내 몸은 그대 안에 들지 못했더랬구나
내 마음 그러니까 그대 몸 껴안지 못했더랬었구나
그대에게 가는 길에 철철 석유 뿌려놓고
내가 붙여냈던 불길들 그 불의 길들
그러니까 다 다른 곳으로 달려갔더랬구나
연기만 그러니까 매캐했던 것이구나
- 이문재 시 <마음의 지도>
시를 읽는 일은 마음에 그림을 새기는 일이다. 시를 쓰는 일은 마음에 새긴 그림을 언어로 변주해내는 일이다. 그리하여 시 쓰는 이는 시 읽는 이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샛길로 들어섰던 길에서 돌아나와 곽재구의 포구행 길 위로 다시 들어선다.
곽재구는 오지의 포구를 떠돈다. 속이 울렁거린다. 어지럽다. 작은 배를 타고 처음 바다로 나섰을 때의 그 울렁거림. 볼품없는 포구에 묶인 배들은 잔물결에도 출렁거린다. 마음이 울렁거린다. 그 울렁거림이 나를 거리로 내몬 적이 있다. 내 태생은 본디 길 위에 놓이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나는 그러한 내 태생이 싫어 억지로 길 위로 스스로를 내몰았다.
길에 서면 누구나 선택의 갈림에서 갈등한다. 모든 여행자들은 숙명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는 경우를 만난다.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냉정한 그 순간을 외면하고 싶은 것. 간혹 여행길에서 그러한 경우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나그네는 길 위에서 하룻밤 묵을 지명을 정할 때 행복하다. 여기저기 길들의 영혼이 옷자락을 붙드는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안산은 따뜻하다. 지명 속에 포근한 꿈자리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나그네에게 안락함은 독이다. 안락함을 즐겨 선택하는 나그네는 오래 길 위에 서지 못한다.” (<포구기행> 238쪽)
 |  | | | ▲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곽재구 지음, 한양출판, 1993 | | | ⓒ 한양출판 | 곽재구의 여행은 관조가 아니라 스밈이며 섞임이다. 삶의 뻘밭에 두 발 디밀고 살아가는 이들 가까이에 그도 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발목을 잡아당기는 뻘흙처럼 나를 끌어당긴다. 그의 글은 삶의 비린내로 넘쳐난다. 그 문장들이 내 마음까지 떠밀려와 닿을 때마다 나는 울렁거림과 아득한 현기증 속으로 꺼져 들어간다.
오래 전, 그의 책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한양출판, 1993)을 읽을 때도 그러했다. 예술가의 숨결을 더듬는 그의 글은 모가지 댕강댕강 떨구며 봄날을 보내는 동백꽃처럼 붉고, 뜨거워서 어지럼증이 일 때가 많았다.
“남해의 푸른 바람과 싱싱한 햇살을 머금은 동백꽃들이 나무 숲 가득 피어 있는 모습은, 여행자에게 아름다움이란 먼 곳의 불빛이 아니라 살아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빛과 체온이라는 느낌을 지니게도 한다. 게다가 시멘트로 포장된 길 위에 툭툭 떨어진 동백꽃들. 산화 공덕의 찰나가 길 위에 펼쳐진다.” (<포구기행> 256쪽)
곽재구는 포구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포구에서 자주 시를 읽는다. 그가 읽는 것은 자신 내부의 시다. 그리하여 그는 쉬지 않고 마음 속에 풍경을 새긴다. 그가 마음에 새겼던 그림을 다시 변주해낸 언어를 나는 읽고 있다. 그의 산문은 시에 가깝다.
덧붙이는 글 | <곽재구의 포구기행>, 곽재구 지음, 열림원, 2002, 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