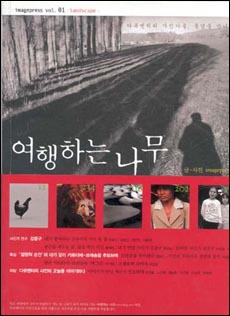
▲<여행하는 나무> 책 표지 ⓒ 청어람미디어
'다큐멘터리 사진가들, 풍경을 만나다'라는 부제가 붙어있기도 한 이 책은 부제가 말하고 있듯이 이상엽, 노순택, 성남훈씨 등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들이 '풍경'이라는 테마로 엮은 무크지입니다.
위에 언급한 사진작가들이 자신의 사진을 놓고 펼쳐가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즐거움 못지않게 이 책의 특집이랄 수 있는 사진작가 강운구나 '결정적 순간'의 대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읽는 재미도 솔찬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만난 풍경과 이야기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사진작가 이갑철씨가 찍은 사진에다 자칭 '할머니를 싫어했던 망할 년'인 자유기고가 천수림씨가 글을 붙인 '할머니, 풍경 속에'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해사하게 꾸미고서, 양산을 쓰고 읍내장에 나간 할머니를 찍은 사진 밑에는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변화없는 삶이라고? 내 속엔 여전히 이토록 많은 여자들이 드나드는데,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늘은 그저 '나 자신'일 뿐인데. 어째서 늙은 여자에게는 푸른 심장이 없으리라 생각하는가. 그녀는 내게 묻는다."
늙은 여자에게는 푸른 심장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이 자유기고가는 할머니가 자신이 사시던 생의 셋방을 빼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할머니가 내뱉곤 했던 "아무도 사랑해 본 적 없다"라는 거짓말을 이해하게 되고 저 세상에선 할머니가 더 이상 붉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생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서한강씨가 자신의 사진과 함께 글을 쓴 '종가집 제사 풍경'이라는 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제사란 게 단지 조상숭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4촌 같은 가까운 친척들마저 함께 모이는 일이 드문 요즘, 제사가 가진 친족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은 더 커졌다고 진단하는 것이지요.
노순택씨는 점점 무뎌가고, 느슨해져만 가는 분단에 대한 감각을 되살려내려고 애쓰는 사진작가입니다. 그는 조국 분단의 풍경을 드러내고, 그 분단의 희생자 뿐 아니라 분단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런 분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망각의 늪으로부터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그의 사진과 글을 읽어 가노라면 우리 시대가 가진 모순의 단서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지요.
이상엽씨가 숭산스님의 다비식을 찍고 짤막한 글을 덧붙인 '죽음, 그리고 낯선 풍경'도 빼놓을 수 없는 읽을거리지요. 글 마지막에서 이상엽씨는 절집 개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 합니다.
"어차피 그 모든 것이 죽은 자를 위한 것인가? 산 자를 위한 것이지. 난 관심 없네. 잠이나 자야지."
여기까지 숨 가쁘게 읽고나면 이야기는 어느 새 우리 시대,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걸출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1세대인 강운구와 그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진작가 김중만은 그가 강운구를 좋아하는 것은 사회성과 감수성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강운구의 사진을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랍니다.
영화배우 안성기씨는 '내가 좋아하는 강운구의 사진 한 장'이라는 짧은 글에서 이렇게 말 합니다.
"오래 전 영화지만 <고래사냥>을 촬영할 때, 촬영지였던 강원도 임계에서 우리 마을의 전형을 본 일이 있다. 또 <만다라>를 찍을 때 눈밭을 거닐며 스쳐가듯 포착한 우리 마을의 풍경도 떠오른다. 강운구 선생의 이 사진에서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때 보았던 푸근함이다. 지붕과 지붕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듯한 느낌. 몸과 몸이 서로 부비고 온정을 나누는 듯한 그 모습이다. 서로 엉키고 맞닿아 있는 초가의 모습들에서 이웃에 대한 정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강운구씨 "작가란 근본적으로 외톨이여야 한다"
이상엽씨 등과 한 인터뷰에서 강운구씨는 "작가란 근본적으로 외톨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면 작가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들도 재미없진 않지만, 특히 저 같은 문외한에게 와 닿는 이야기는 사진이 아닌 카메라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운구씨의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으로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못쓸 정도의 카메라나 렌즈란 없거든요. 요근래 나도 작은 카메라로 편하게, 걸어다니며 찍습니다. 내가 찍은 신작 중에는 작은 똑딱이 카메라로 걸어가면서 찍은 것도 있지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 저런 양반도 그런 별 볼 일 없는 카메라를 쓰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제 주변에도 디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장만했던 디카 기종을 사소한 이유로 바꾸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옛말이 그냥 나온 말이겠습니까?
산책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진작가 브레송
'결정적 순간'의 대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에 대한 추모 특집은 이제는 추억에서 신화로 남은 프랑스의 저명한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브레송에 대한 몇 개의 글들은 그가 진실한 것만이 사진이라고 믿었던 절대적 순수주의로 가득 찼던 작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특집의 맨 끝에 실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카메라'라는 부제를 단 이상엽씨의 글 <브레송과 라이카>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레인지파인더가 장착되지 않은 라이카를 구입한 브레송이 얼마나 부단하게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했던가에 대한 이야기는 브레송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진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아니가 합니다.
"내게 있어 사진은 발전된 조형적 매체다. 그리고 그 매체는 시간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찰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브레송의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라이카 카메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도구에 틀림없다고 이상엽씨는 결론짓습니다.
사진 읽기는 단순히 공간 자체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책 속에 나오는 윤세진씨의 글 '강운구의 수분리와 용대리 사진에 대한 단상'은 우리에게 풍경 사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사진을 보는 일은 사진 속의 피사체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맥락을 보는 것이다. 공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채운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이 책에는 '아시아의 풍경' 등 읽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는 많은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있어 우리의 무딘 감각을 깨워주고 부족한 감성을 채워 줍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기록 매체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많은 독자들은 작은 씨앗에서 나무가 되었다가 어느 날 고목이 되어 바다로 가는 나무같은 책 <여행하는 나무>를 읽어가는 동안 스스로 그 해답을 찾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여행하는 나무>
저자:이미지프레스
출판사:청어람미디어
가격: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