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들이 불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풍선이 터질 듯 꽃봉오리가 탁탁 터진다. 입안에 밥을 잔뜩 문 채 웃음보가 터졌을 때 나오는 밥알 같다. 숲에서 들에서 밭둑에서 둔덕에서 길가에서 그리고 우리 농장의 꽃밭에서. 흙이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넓은 곳, 좁은 곳, 돌 틈, 마른 풀 사이를 가리지 않는다. 홀로, 무리지어, 더불어 피어난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생의 환희다."(287쪽)같은 시골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원숙자 작가는 본다. 아니 보지 못한다기보다 그리 느끼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이 맞다. 남편이 은퇴하여 고향에 귀농하여 살고 있고, 저자는 도시에 살면서 가끔 그 남편의 농장에 와 도우며 글을 짓는다. 그 지어진 글이 <우리는 일흔에 봄을 준비했다>이다.
내가 사는 집 둘레에도 온갖 꽃들로 즐비하다. 지금은 황국이 피었다 져간다. 이어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폈다. 하지만 그냥 들꽃이 피었다 지는구나, 생각한다. 그 풀꽃과 나무들이 지어주는 웃음을 읽지 못하고, 아우성을 듣지 못한다. 집 언저리로 자라나는 나무들을 전지하고 잔디를 깎으며 일쩝다는 생각만 했으니 참 밋밋한 인생이지 싶다.
사물을 보는 눈이 도드라진다무척이나 옹골찬 문장 속에 나무를 담고 풀꽃을 담고 농작물을 담는다. 아침 운동을 하면서 맞닥뜨린 변두리의 풀 나무를 보고 풀어내는 이야기, 씨앗을 심고 가꾸면서 꾸미는 이야기, 남편과의 대화나 6살 손자와 나누는 이야기 등 수수하지만 문장 속에 담긴 날실 씨실은 올올히 도드라진다.
저자는 <당신은 저녁 해 나는 저녁노을> <나뭇잎 바이올린 켜줄게> 등의 수필집을 낸 수필가답게 한 글발 한 문장을 쉽게 쓰지 않는다. 모든 글발이 그냥 나오는 무늬가 아니다. 많은 독서와 남들보다 한발 앞서 보는 눈이 그런 글발로 독자를 압도하지 않나 싶다. 책을 읽는 내내 자연과 사랑하며 곱게 늙어가는 한 여인의 향긋한 내음을 맡을 수 있어 행복했다.
밭에 작물을 심을 때 비닐을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관찰하고 이렇게 쓴다.
"대개는 검정색 비닐을 덮어주는데 이것은 빛을 차단해 엽록소를 만들 수 없게 해서 잡초를 죽게 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살아남은 잡초라 하더라도 햇볕을 받아 뜨거워진 검정 비닐 때문에 데어 죽는다고 한다. 왕겨를 덮어주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워주면 잡초는 죽지만, 잡초 때문에 성장을 방해받던 마늘은 감기몸살도 앓지 않고 제대로 잘 자란다."(16쪽)비닐이 주는 농사의 편리성을 이리 말하다가도 나뭇가지에서 흩날리는 비닐 조각을 보며 걱정한다. "썩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주검"이라며. 시골에서 흔한 풍경이고 사람들은 으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 나도 편리한 비닐 농법이 지구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터라 저자의 이런 섬뜩한 표현이 마음을 짓누른다.
저자는 제비꽃 하나를 좋아해도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제비꽃 씨앗에 '엘라이오솜'이 들어있다며 개미가 이 성분을 좋아해 제비꽃 씨앗을 가져다 '엘라이오솜' 성분만 먹고 버리게 되어 이곳저곳 퍼지게 된다고 일러준다. 오묘한 창조섭리를 빈틈없이 잡아낸다.
쇠뜨기 풀을 이야기하며 "쇠뜨기는 연대의식이 보통이 아니다" "소 뚝심을 닮아 쇠뜨기"라고 쓴다. 그 번식력을 두고 한 표현이다. 할미꽃을 심고는 "할매요, 이제 무덤가에 살지 말고 우리 농장으로 가요"라고 말을 건다. 서울에서 남편에게 할미꽃의 안부를 묻는다. "할매 어때요? 살아났어요? 건강해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잘 보살펴야 해요. 흙이 마르지 않게 물도 주고요"라며 잔소리를 한다. 저자의 눈은 도렷이 다르다.
우리네 팍팍한 삶을 질타한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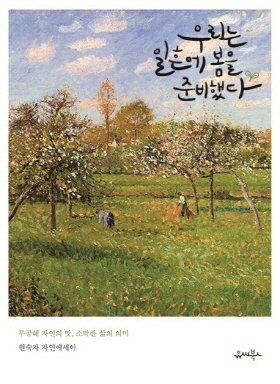
|
| ▲ <우리는 일흔에 봄을 준비했다> (원숙자 지음 / 유씨북스 펴냄 / 2016. 6 / 296쪽 / 1만2800 원) |
| ⓒ 유씨북스 |
관련사진보기 |
하지만 시골살이의 괴로움도 토로한다.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시냇가에 엄마 주검을 묻은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개구리 울음은 어쩌면 부모 돌아가신 후 후회하는 인간을 질타하는 소리"라며 우리네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수더분한 시골 냄새가 글발 곳곳에 스며있다. 아마도 일흔에 봄을 심겠다고 시골로 내려온 어른에게서는 이런 향기가 나나 보다. 저자는 '살아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치켜세운 이웃 봉화 아저씨의 말을 인용해 이리 쓴다. 이 한 줄이 왜 이리 밋밋하지만 좋은지.
"모종이 땅 냄새를 맡아야 해여, 그래야 안 죽어"(51쪽)'흙냄새'란 단어에 향수를 느끼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동경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것은 다 환상이다. 저자는 마늘을 심기 위해 새벽 2시까지 마늘을 까며 이렇게 말한다.
"마늘 눈을 보호하며 껍질을 벗겨냈지만 한 접도 못하고 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엉덩이도 아파 더 이상 깔 수가 없다. 무엇보다 손끝이 아리고 손목이 말을 듣지 않는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이다."(61쪽)농산물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하찮게 여기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고춧잎을 솎아 누구에게 줄까를 고민한다. 고춧잎이 한보따리에 1000원 밖에 안 한다. 시골의 시어머니가 고춧잎을 한보따리 이고 서울 며느리 집엘 갔다. 며느리는 외출 중. 전화로 "어머니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했다고 한다.
그 섭섭함이 어떠했겠는가. 그래서 저자가 한 고랑을 따면 한보따리인 고춧잎을 누구에게 줄까 고민한다. 한 친구를 생각해 내고 전화로 고춧잎을 준다니까 반색을 한다. 저자는 그런 친구가 있음을 행복해 한다.
"'어마, 그 귀한 걸 나까지 줄 수 있어?'주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 받으면서 세상에 둘도 없이 귀중한 걸 받는 사람같이 고마워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가슴이 뿌듯하다."(44쪽)우리가 이런 친구가 되면 어떨까. 저자는 왜 토마토가 채소가 되었는지를 밝혀주는데, 참 흥미롭다. 18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토마토를 채소로 결론 냈는데, 이는 채소여야 과일에 안 붙는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이었단다. 그 이유를 '요리해서 먹는 것'이라고 했다는. 좀 궁색하긴 하다. 결국 토마토가 자본주의 논리에 농락당한 것이다. 저자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꼰다.
책을 읽으며 이름(원숙자)처럼 저자의 '원숙'한 삶의 무게를 만질 수 있어 행복했다. 같은 시골도 다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싶다. 시골살이가 이리 아름다운가, 생각하며 내 삶을 다진다. 시골에서의 내 삶도 그리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바람을 품으며.
큰사진보기

|
| ▲ 집 둘레에도 온갖 꽃들로 즐비하다. 지금은 황국이 피었다 져간다. 이어 개망초가 흐드러지다. 하지만 그냥 들꽃이 피었다 지는구나, 생각한다. 그 풀꽃과 나무들이 지어주는 웃음을 읽지 못하고, 아우성을 듣지 못한다. |
| ⓒ 김학현 |
관련사진보기 |
덧붙이는 글 | <우리는 일흔에 봄을 준비했다> (원숙자 지음 / 유씨북스 펴냄 / 2016. 6 / 296쪽 / 1만2800 원)
※뒤안길은 뒤쪽으로 나 있는 오롯한 오솔길입니다.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의 오솔길을 걷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 보지 않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