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나홍진, 2016)의 스산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믿었던 순간, 이승우의 소설 <한낮의 시선>(이룸, 2009)을 읽으며 기시감을 느꼈다. 영화 <곡성>의 무시무시한 장면인 산속 나체의 노인이 다시 떠올랐다. 퇴근 길 승용차를 혼자 몰고 가며 흘끔흘끔 뒤를 돌아보곤 했던 필자다. 소설 초반부의 숲 속 산책 장면은 다시금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직접 읽어보자.
그날, 옷을 입지 않은 채 숲길을 걸어가는 한 남자를 보았다. 키 큰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붉은 석양빛을 받으며 남자는 휘적휘적 걸었다. 산짐승으로 오해하기에는 날이 아직 어둡지 않았고, 직립의 자세가 너무 확연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에도 산길을 걷는 사람과 부딪친 적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다. 공연히 귀찮을 것 같아 부러 길을 바꿨는데도 어쩐 일인지 그 사람과 마주치고 말았다. (26쪽)
누군가 금방이라도 뒷덜미를 잡아챌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몸이 굳어 버릴 것 같아 그러지 못했다.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떠올랐다. (28쪽)
사실 소설은 영화와 연관성이 없다. 소설의 위 장면만 <곡성>을 떠올리게 할 뿐 전체 줄거리는 당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전체적인 어둡고 우울한 측면, 주인공의 유약함, 지역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평범함 일들 그리고 일상에서 간파되는 소소한 악들의 향연은 충분히 <곡성>을 떠올리게 할 만하다.
<곡성>을 떠올리게 하는 이승우 소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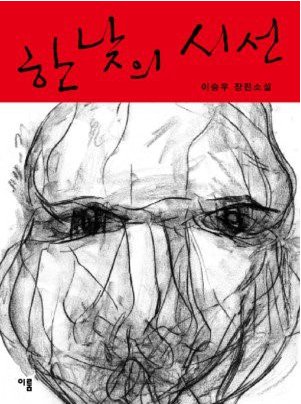
|
| ▲ 책 표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풀어낸 구원의 메시지는 한 인간의 성장통이다. |
| ⓒ 이룸 |
관련사진보기 |
주인공 한명재는 폐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육체적 휴양을 위해 천내의 전원주택에 머물게 된다. 이곳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인공 한명재에게 마음의 안식과 정신적 안정을 되찾아준다.
아버지의 부재를 잊게 할 만큼 헌신적인 어머니와 매우 적극적이며 속물적인 애인으로부터 벗어나 내 영혼으로 침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인공에겐 크나큰 행복이다. 그런데 옆에 살고 있는 퇴직 노 교수를 만나게 되면서 주인공 삶에 파장이 그려진다.
위 산책 장면은 주인공이 겪는 혼란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심리학과 출신의 노 교수는 마치 학생을 다루듯, 대화를 하다 주인공의 아버지를 무심코 물어본다. 사실 주인공이 대학원생이긴 하다. 나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변명하듯 말하던 주인공은, 없다는 것은 돌아가셨다(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충고하는 노 교수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노 교수는 "어떤 경우에는 죽어서도,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버지지"라고 말했다. 주인공 한명재의 아버지는 같이 살지 않을 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망각의 아버지, 그가 드리우는 그림자이제 한명재는 아버지를 찾아 떠난다. 그는 휴전선 근처 인구 3만의 낯선 도시로 이끌리듯 향한다. 존재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냈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다. <말테의 수기> 첫 문장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모여든다. 하지만 내게는 도리어 죽기 위해 모인다는 생각이 든다"를 인용하며 시작되는 이승우의 <한낮의 시선>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지상의 모든 아들들이여, 그대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인가.
주인공에겐 부성애를 못 느끼게 할 만큼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지는 나이가 됐다. 그 이유를 이승우는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다 커버린 아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보호해주고 공격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시점이 모든 아들들에게 온다.
이승우는 어머니의 헌신이 죄책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모든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부채다. 어머니가 아니라면, 아들이 기댈 존재는 아버지뿐이다. 주인공을 빌어 이승우가 얘기하는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엿보자.
울타리는 튼튼하지만 허전하고, 울타리 안의 정원은 풍요롭지만 쓸쓸했지. 모퉁이를 돌아갈 때 느끼곤 했던 어떤 낯익은-낯선 시선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실은 근거가 있었던 거지. 어머니는 내 존재의 완전한 배경으로 손색이 없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불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아버지 역할까지 모자람 없이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미묘한 차이를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의해 무화되었다. (52쪽)
아버지의 부존재가 불러온 결과는 '한 낮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무언가 억눌려 있는 인격체로 만든다. 책 제목이 왜 <한낮의 시선>인지 가늠할 수 있다. 한명재는 언제나 이방인처럼 살아왔다.
무언가 막혀 있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말이다. 낯선 도시에서 이방인은 자주 오래 멈춰 서서 헤매는 자이다. 뚜렷한 목표 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이방인. 한명재는 나이 서른이 다 되도록 자신의 삶을 이방인으로 살아왔다. 자, 이제 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완벽하게 버림받거나, 온전히 사랑받거나그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일이다. 방법은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버림받거나 온전히 사랑받는 것뿐이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낫다. 주인공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어떠한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보통명사로서만 그 위대함을 전한다.
이승우는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보다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훨씬 억압적이라고 적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지 않은 아버지는 온 우주를 지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명재는 끝까지 가본다. 지역 단체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비록 선거에 영향을 주더라도 말이다. 선거는 아버지에게만 중요할 뿐, 한명재에겐 별 상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완벽하게 버림받는 일이다. 작가 이승우는 '사랑한다'는 행위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동사라고 적었다. 아들은 단지 아버지를 찾는 운명의 굴레를 짊어졌을 뿐이다.
한명재는 끝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받지 못 한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선 다시 <말테의 수기> 마지막 문장이 등장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오직 한 분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 분은 좀처럼 그를 사랑할 듯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그의 사랑을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아들의 존재감을 상실하는 일이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받지 못 했지만, 다행히 완벽하게 버림받음으로써 즉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토해 냈다.
노트에 마구 써 내려간 것이 무엇인지 나오진 않지만 한명재는 한 단계 내적 성장을 경험한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모든 도전과 위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스스로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때늦은 성장통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작가 이승우가 말하고 싶었던 구원의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