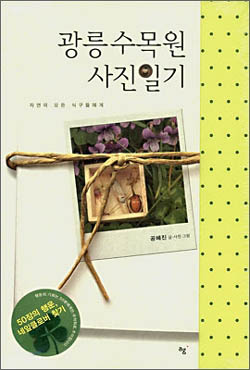
▲책 <광릉수목원 사진일기> ⓒ 안그라픽스
자연이 살아있는 곳을 지나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접사 촬영'을 위해 웅크리고 앉은 사진가들을 만나게 된다. 사진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는 나에게는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하기만 하다. 도대체 꽃 한 송이 찍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저렇게 오랜 시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광릉수목원 사진일기>는 사진과 식물에 무지한 나에게 신선한 기쁨을 선사해 준 책이다. 1년 365일 매일 수목원을 찾아 그곳의 식물과 곤충의 모습, 나무의 소소한 변화를 사진에 담은 작가의 정성이 대단하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도 대단하지만 그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더 존경스럽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오래 바라보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온갖 자연물로 꼼지락거리기, 틈새에 나오는 풀들에게 말 걸기, 아이들과 놀이하기, 흙으로 만들기, 혼자 놀기, 기록하기, 모으기, 공상하기'라고 소개한다. 그래서 책의 사진과 그림, 글 모두 한 사람의 작품이다.
프롤로그에서 독자를 향한 말 걸기를 시작하는 작가. 그는 평범한 도시의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도라지 꽃봉오리 터질 때 나는 소리를 들어 본 적 있어?
땅을 뚫고 나온 작은 싹들을 피해 걸어 본 적은?
눈 위에 난 알 수 없는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 본 적은? (중략)
땅을 뚫고 나온 두더지와 눈이 마주쳐 본 적은?
낙엽이 머리 위로 떨어져 깜짝 놀라 본 적은?"
이런 질문에 '그런 적 있어'라고 대답할 수 있는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싶다. 작가가 3월 21일에 찍은 사진은 마른 나뭇가지에 솟아오른 봄눈이다.
저자는 이 시기에 숲에 가면 봄의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자꾸만 뒤돌아 보게 되고 뒤돌아서 다가가 보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바로 봄눈들이 마른나무 가지 끝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만난다.
겨우내 죽어 있는 가지 같지만 봄눈을 피워올리는 걸 보면 자연의 생명력은 참으로 신비롭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각양각색으로 변하는 수목원의 모습은 경이롭기 그지없다. 산자고라는 식물을 찍기 위해 땅바닥에 한 시간 째 붙어 있다 보면 자연스레 봄이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있다는 작가.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다 보면 도시에 파묻혀 사는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파박-'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는 제비꽃 씨앗, 이 씨앗이 터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8일 동안 카메라를 들고 꽃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자연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자연이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경험하기도 한다.
"내 다리 밑에는 뿌리가 없어/ 깊어지지 못하고 똑바로 서지 못하니
나무에게로 가서/ 살며시 사다리를 세우고/ 살며시 옮겨가
손을 뻗어 가지를 만드니/ 손에 새가 앉고/ 몸에는 잎들이…/ 겨드랑이에서는 가지가…//
바람이 이니/ 나무가, 아니 내가 나무가 되어 살랑였다. - 7월 24일"
작가는 이런 글귀와 함께 나뭇가지와 혼연일체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 양손을 벌리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가 마치 나무와 하나가 된 것만 같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
나는 자연에 대해 그다지 깊은 애정을 가진 편이 아니다. 도시의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 '귀농'이나 '자연으로의 회귀' 등의 단어를 들으면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에 대한 내 생각은 새롭게 정립되는 느낌이다.
내가 소홀히 생각하고 도외시했던 자연이라는 친구는 항상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사시사철 변화하며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연을 보면서 숲과 나무, 작은 꽃 하나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이 책은 자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친근감을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저자는 책의 에필로그에서 숲으로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머릿속의 기억 장치가 고장 나게 해 달라고 빈단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본 것들이 기억나지 않아야 자연의 풍경이 또다시 새롭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연이 늘 처음처럼 낯설고 신비롭기를 기도하는 작가.
그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1년 365일 아침 점심 저녁의 수목원 풍경은 다르고 또 다르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자연의 작은 아름다움은 얼마나 더 많을까? 책에서 소개하지 않은 다른 모습, 숨은 자연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문득 수목원에 가고 싶어졌다. 비록 좋은 카메라가 없더라도 내 눈 속에 그 소소한 변화를 담고 돌아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