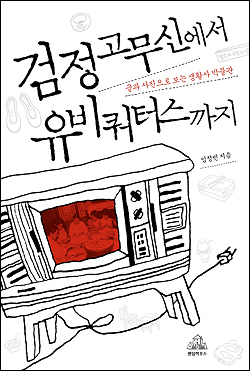
▲임정빈의 <검정고무신에서 유비쿼터스까지> ⓒ 랜덤하우스코리아(주)
지나간 것에 대해 추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난 시절을 이겨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극복되지 않은 현재진행의 날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인간은 항시 과거를 근간으로 매순간순간의 짧디짧은 현재의 연속을 사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현재는 늘 그렇게도 재빠르게 과거의 시간대로 넘어가버리고 미래는 또 늘 그렇게 눈앞에서 애태우며 아른거리기만 할 것이니 말이다.
임정빈의 <검정고무신에서 유비쿼터스까지>는 과거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기억을 되살려주는 책이요, 추억을 음미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은 책이다.
지은이는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책의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그 시대를 보여 주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하였다 - 6쪽)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에세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그 시절의 생활보고서 쪽에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은이의 추억과 상념 몇 자락이 군데군데 잡히는 것도 같다.
대문은 두 짝으로 되어 있어 빗장으로 안에서 잠갔다. 대문을 열 때 '삐-걱' 하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오시는지, 아버지가 오시는지, 아이들이 오는지 알아차렸다. 문이 얼마만큼 많이, 그리고 힘 있게 열리는지 그 소리로 알 수 있었으니까. (76쪽)
이런 부분은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기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기억을 더듬자면 대문을 열기도 전에 어느 만치서 부모님 목소리가 들려오다가 이윽고 밀치는 소리가 나거나(때에 따라서는 부리나케 나가 대문을 열어드리기도 하면서) 이웃사람이나 동네사람이 우리집을 찾아올 때도 빼꼼히 여는 문소리와 동시에 누구 있냐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했던 것 같다. 어린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들이닥치듯 대문을 열어제끼곤 했던 것도 같다.
이 책을 읽는 방식은 아무래도 '책 속의 정보'와 '자신의 기억' 간의 '비교 대조'와 '조합 합성'이 될 것이다. 책에 기록된 그 시절의 풍경과 자신이 겪었거나 기억하고 있는 그때 그시절의 일들을 떠올려가며 맞춰보고 사이사이에 새롭게 살아나는 기억들이 있다면 반가운 한편 고마워할 일일 것이다.
지금이야 별의별 전기밥솥이 다 나오고 집이라는 공간 개념도 나날이 변화 발전하고 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시골집 부엌 풍경은 부뚜막에 솥이 몇 개 걸려 있고 약간 높은 곳에는 찬장이 있으며 저쪽 한켠에는 땔감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생각해보면 이른바 '입식부엌'으로 바뀐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아, 그리고 부뚜막 위쪽에는 여차하면 머리 부딪히기 꼭 알맞은 다락이 퉁맞듯 튀어나와 있던 것도 떠오른다. 이 책에도 '다락'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아이들은 이 다락에 올라가서 놀기를 좋아했다. (중략) 책을 읽다가 낮잠이 들기도 하는데, 엄마는 밥 때가 되면 그것도 모르고 아이를 찾느라고 밖에서 헤매고 다니곤 했다. (77쪽)
부뚜막은 고생스러운 우리 어머니들의 일상이자 일생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소두방운전수'라는 자조 섞인 말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마는 그때는 그다지 별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홍두깨' 책에는 다듬이질용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홍두깨'는 국수밀이 방망이다. 둥글둥글하고 길쭉한 것이 무거웠었는지 가벼웠었는지 기억은 흐릿하지만 희끗희끗한 것이 늘 묻어 있는 채로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만은 또렷하다. 그리고 다듬이방망이는 워낙 반질반질하고 단단해서 이것으로 엿을 깨먹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장난 치기에도 좋은 도구였던 것 같다.
옛날에는 스프레이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입으로 물을 뿜어 광목을 축여서 개었다. 광목 폭만큼씩 길이로 병풍 접듯이 접은 다음 양편에서 서로 어슷어슷 잡아당기며 큰 주름살을 폈다. (중략) 이렇게 해서 잘 접은 광목은 면 보자기로 싸서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꼭꼭 밟으면 큰 주름이 펴지고, 그 다음은 다듬이질로 빳빳하고 윤기 나게 만들었다. (13~14쪽)
나 역시도 다듬잇돌 위의 천을 질근질근 밟은 적도 있고 어머니와 이 천을 서로 잡아당기기도 했었다. 그때 어머니는 팽팽하게 잡아당기라고 했으나 힘에 부친 나머지 자꾸 어머니 쪽으로 끌려갔었던 것 같다.
여하튼 그래보았자 나의 기억은 7~80년대이다(이 책은 보통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쯤까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비록 이런 나의 미미한 기억들이 세세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러한 기억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기억하고 고향을 떠올리는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책은 이러저러한 나이자 우리의 기억들을 확인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길목이기도 할 것이다.
좋은 기억을 그득그득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저런 일들을 품어안아서 좋은 기억으로 돌려놓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재산가일지 모르겠다.
덧붙이는 글 | * 지은이: 임정빈 / 펴낸날: 2006년 10월 2일 / 펴낸곳: 랜덤하우스코리아(주) / 책값: 1만 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