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진정 편안하고 안락한 단 한 곳, 나의 집. ⓒ 양지혜
결혼생활 23년 동안 16번 이사했다. 그중 서울의 이곳저곳을 살아 보면서 어지간하면 서울땅을 다시 밟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건만, 이제 일주일 후면 7년간 정든 지금의 집을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한다.
내 나이 아홉 살 때 '자식공부는 서울에서 시켜야 한다'며 경상도 상주 산골 교사였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시작한 서울살이. '촌티'나는 사람들의 막막하고 험난했던 서울살이 탓이었던지 35년이 지났어도 내게는 여전히 아홉 살 적 낯섦과 어색함이 전부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서울은 내게 맞지 않은 커다란 신발처럼 항시 겉돌고 헐떡거리는 버거움이었다. 아무리 살가운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곳. 그래서 결혼 후 분가를 할 때부터 '탈서울'을 시작해 틈틈이 서울을 벗어나려 애를 썼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로의 이사를 앞두고 있으니 심란하고 착잡함이 이루 말할 나위 없다.

▲뜨락에서 종종거리는 저 까치의 이삿짐은 뭘까? ⓒ 양지혜
지금의 이 집은 난생처음 마련한 '내 집'이었다.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쥔 첫날, 설렘에 잠 못 이루며 남편 도장이 '콕' 박힌 빨간 인주 자국을 보고 또 보며 꿈이 아닌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던 이 집을 떠나야 한다. 35년 전 내 부모님과 같은 이유인 아이의 교육 탓을 하며.
그렇게 서울 변두리로 들어설 이삿짐을 싸면서 살림에 앉은 먼지처럼 내 마음에도 켜켜이 쌓인 사연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아무리 털어내고 닦아도 좀처럼 쉬 떨어내 지지 않는 껌딱지 같은 미련과 아쉬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도장 찍었던 등기부 등본처럼 '처음'으로 얻었던 것들이 유난히 많았던 지금의 집.
늦게 가진 아이와 함께 만든 역사. 복잡했던 시댁 어른들의 대소사.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고, 우왕좌왕 흔들렸던 일상들이 그대로 녹은 궁상스런 고물짐들을 정리하면서 일껏 편치 않은 내 마음을 아는지 남편도 아이도 요즘 내 눈치만 살핀다.

▲이사 한 번에 사연 한 보따리가 따라가는 삶. 비가 내리는 날 이사갈 집을 찾아다녔다. ⓒ 양지혜
라면만 먹고 살더라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자고, 비새는 판잣집이면 어떠냐고 물려 줄 자식도 없는 재산에 욕심내지 말자며, 큰소리 '뻥뻥' 쳐대던 남편이 마흔 중반에 얻은 아이를 위한 각오로 마련했던 집.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웠던 IMF가 터진 그해, 남들은 있던 집도 팔던 시절이건만 무리를 해서 샀던 집이었다.
동네 앞에 지하철만 뚫리면 떼돈(?)을 벌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기대도 했었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살아도 문제가 없는 '내 집'이 생겼다며, 마냥 편케만 늘어졌었는데. 막상 아이가 커가니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작년부터 늦둥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 공부는 서울에서 시켜야 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생각을 하며 집을 내놨고, 더는 미룰 시간이 없어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팔았건만 막상 이사를 눈앞에 두니 정 떼기가 쉽지가 않다. 참 사람 속 얕고 간사함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볼품이 없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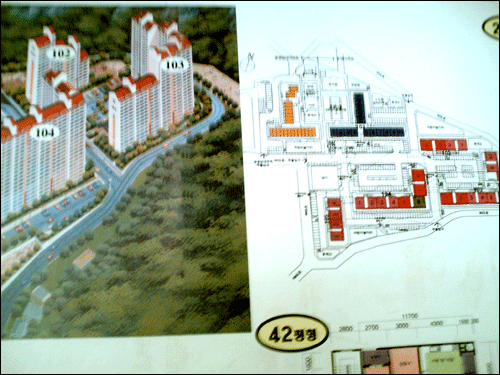
▲내가 살 집을 찾고, 내가 머물 곳을 찾아 떠다는 이사. ⓒ 양지혜
여하튼 정리할 짐을 들여다 니 아이의 것이 많았다. 처음 입혔던 배냇저고리부터 기저귀며 신생아용 목욕통. 그리고 돌날부터 이름 있는 날 입혔던 옷가지며 신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뒀던 것들. 이참에 '큰맘' 먹고 깨끗이 정리하겠노라며 단단히 마음먹었건만 짐 무더기 속에서 나는 연신 다시 건져 올린다. '이건 안 되겠다. 이 날 얼마나 이쁜 모습이었는데.' '이 신발 신고 울 꿀단지 엄청 귀엽게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었는데….'
그렇게 이번에도 정리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짐을 싼 것은 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틈틈이, 겹겹이 담아있고 묻어있는 내 마음이었다. 그때였다. 곁에서 그런 나의 허튼(?) 궁상을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했다. "남들은 서울로 이사 간다고 부러워하는데 왜 그리 청승이요? 제발 버릴 것 좀 버립시다!"
남편의 무심한 참견 한마디로 참고 있던 부아가 터지고 흰 눈자위가 치켜 올라갔다. "집 작아졌다고 누가 뭐랬어요? 집 작아서 이고 지고 살 거라도 못 버려요!"

▲마음 한가득 남아 있는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고 정든 집을 떠나는 이별이 아프다. ⓒ 양지혜
그러나 아이가 동네 친구들에게 서울로 이사 간다는 말을 해대서인지 옆집이고 옆 동의 안면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니 좋겠다고 한마디씩 인사말을 하지만, 이사 갈 집의 생경함을 덮어 주지는 못한다. 아이 학교와 지하철을 보고 선택한 이사 갈 집은 둘러볼 때마다 어설프고 황망한데, 이삿짐을 싸다 보니 좁아진 집과 버릴 수 없는 짐 탓에 자꾸 한숨이 나온다.
서울로 바뀐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의 집에서 7평을 줄이는 이사. 그 줄어든 공간만큼 지금의 집에서 버리고 가야 할 짐들이 많건만, 손때 묻은 짐들을 버릴 때마다 언제나 가슴은 주책없게 알싸해진다. 손길 닿는 모든 것들이 찐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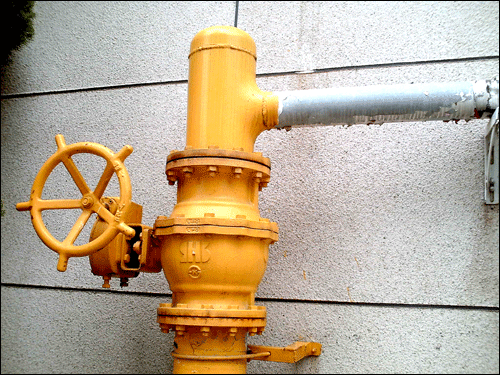
▲꼭 잠궈 둔 아스라한 기억들이 이삿짐 속에서 폴폴 먼지처럼 날린다. ⓒ 양지혜
그러나 이 집을 팔았던 일도 행운이라면 행운이 아니었을까. 집이 크다 보니 매매하는 데 1년이 걸렸다.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휘청거리던 아파트 값. 어쩌다 반상회에 불려 나가면 일껏 하는 소리들은 아파트 값 하한선을 묶어 놓자는 아줌마들의 원성. 분위기상 싸게 집 팔고 나가겠다고 속을 태우던 사람들은 괜스레 슬슬 눈치를 보는 야릇한 긴장감이 감돌았었다.
나 또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눈치가 보여서 별별 핑계를 대며 반상회 불참 벌금을 내는 것으로 때웠다. 그러나 어쩌랴. 다수의 이기심과 개인의 가치가 맞부딪치는 곳은 어디든 존재하는 것을.
그리고 다급해진 마음에 내 집도 내 맘대로 못 판다며 투덜거림이 일쑤였건만. 이리 선뜻 팔리고 나니 감겨드는 아쉬움과 섭섭함은 뭐란 말인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최소한 2천만 원은 더 받았을 텐데…' 정든 집에 대한 아쉬움만이 아니라, 어쭙잖은 복부인 흉내까지 내려던 속내에 혼자 얼굴이 벌게졌다.

▲이삿짐에 빠뜨리지 말고 싸야 할 것은 이 곳에서 자란 아이의 '꿈'이었다. ⓒ 양지혜
그런저런 사연을 안고 이제 '서울특별시민'이 되는 날은 자꾸 코앞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요즘은 4, 5일에 한 번씩 새로 이사 갈 집을 오가며, 아이와 길을 익히고, 새 집 정들이기를 하고 있다. 그래도 도무지 낯선 서울의 하늘은 무거운 내 마음처럼 후텁지근하고 텁텁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유도 출처도 불분명한 우려와 긴장만이 불쑥불쑥 찾아든다. 나이 탓으로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증인가? 1년 간을 준비하며 애달아 선택한 16번째 이사길이 왜 이리 뻐근하고 만만치 않은 걸까? 그렇게 별별 생각으로 혼자 열심히 다독이고 틈틈이 다져 보건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달려오는 시간과 반대로 자꾸 뒷걸음질 친다.

▲환한 희망만이 기다리고 있기를. ⓒ 양지혜
그러나 어쩌겠는가. 서울살이를 결정했으니 없는 정도 만들고, 티끌 같은 이유라도 찾아야 하지 않을는지. 어차피 이고 살아야 할 서울 하늘이고, 새로 뿌리 내릴 내 삶터인 것을.
하여튼 어지러운 서울 하늘이 낯설지 않은 날이 빨리 오기만을 시인의 말이라도 붙잡고 기다릴 뿐이다. 뭉치뭉치 묶인 서울로 갈 이삿짐 보따리에는 어느새 구득한 추억 몇 점이 나 몰래 쌓여 있었다.
'일상은 아무리 귀찮아도 버릴 수 없는 여행가방 같은 것.
여행을 계속하려면 가방을 버려서는 안 되듯,
삶은 소소한 품목들로 나날이 채워져야 한다.
그 뻐근한 일상의 무게가 없으면 삶은 제자리를 찾지 못해 영원히 허공을 떠돌 것이다'
-최영미 <시대의 우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