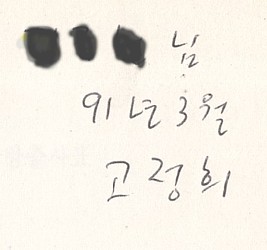
▲고정희 시인이 어느 평론가에게 책을 주면서 적었던 손글씨입니다. ⓒ 고정희
지난주 즈음입니다. 고정희씨가 살아 있을 때 펴낸 시모음인 <여성해방출사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은 사무실 한켠에 있었습니다. 고정희씨가 살아 있을 때 어느 평론가에게 선사한 흔적이 남아 있는 책입니다.
고정희씨 글씨를 손으로 살짝 쓰다듬어봅니다. 죽은 이 느낌은 이미 열세 해나 지나가서 남아 있지 않겠죠. 그러나 무언가, 알 듯 모를 듯 야릇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여성해방출사표>에 적은 머리말을 읽고는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모음 <여성해방출사표>를 처음 만나는 고정희씨 시라고 생각하며 읽습니다.
처음엔 뒷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시를 읽었는데, 시맛이 나지 않는군요. 그래서 며칠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앞부터 다시 읽습니다. 3부로 되어 있는 조금 긴 앞시를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다 보니 '긴 시'가 아니라 짧은 숨고르기로 금세 읽히는 시였습니다.
"황진이가 이옥봉에게" "이옥봉이 황진이에게"가 1부이고 "사임당이 허난설헌에게"와 "허난설헌이 해동의 딸들에게"가 2부입니다. 3부는 "정실부인회와 보수대엽합"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세 꼭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해방출사표>라는 시모음에는 모두 일곱 부로 나누어 짧게 쓴 시를 담은 시들이 중심입니다. 그 뒤에 실은 짧은 시는 그때그때 곳곳에 써 준 시라고 합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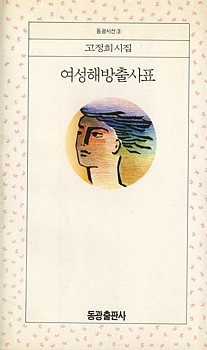
▲시모음 <여성해방출사표> 겉그림입니다 ⓒ 동광출판사
여자가 뭉치면 새 세상 된다네
남자가 모여서 지배를 낳고
지배가 모여서 전쟁을 낳고
전쟁이 모여서 억압세상 낳았지
여자가 뭉치면 무엇이 되나?
여자가 뭉치면 사랑을 낳는다네
모든 여자는 생명을 낳네
모든 생명은 자유를 낳네
모든 자유는 해방을 낳네
모든 해방은 평화를 낳네
모든 평화는 살림을 낳네
모든 살림은 평등을 낳네
모든 평등은 행복을 낳는다네
여자가 뭉치면 무엇이 되나?
여자가 뭉치면 새 세상 된다네
이 시를 읽으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만 일어선다고 해서 새 세상을 낳을 수 있는가?'하는 물음 앞에서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럴까요?
여자는 최후의 피압박계급?
......
최근에 박노해라는 노동시인이
이불을 꿰매며, 라는 여자해방시를 썼다고 하나
찬찬히 뜯어보건대
나도 내 아내를 압제자처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고백에 지나지 않아요.
원통하구려!
오천년 당한 수모 약이 될 수 없으리까
정작 길닦이가 없었나이까
......
그러다가 이 시를 읽고 무릎을 칩니다. 아하. "이불을 꿰매며"란 이름난 박노해 시가 있거든요.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외웁니다. '한다 하는 노동운동가'도 이렇게 집에서는 아내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떠맡기면서 '자기는 대단한 노동운동을 한다고 깝죽대었구나'하고 자랑을 떤 것을 뉘우쳤다고 하면서요. 저 또한 한때 이 시 "이불을 꿰매며"를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한편으로 박노해씨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처음부터 집안일을 나눠서 함께 할 수 없었는가, 왜 처음부터 '일'이라는 것을 안과 밖으로 나누어 왔던가, 그리고 이걸 깨달은 뒤에 동료 '남성노동자'들에게 '일의 나눔'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도록 운동을 했는가... 여러 가지를 살필 때 박노해씨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시 하나 "이불을 꿰매며"는 훌륭했지만 그 위도 아래도 아니었던 거지요.
'깨인 운동가'조차 이렇다면 고정희씨 같은 시인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여성들이 일어나서 이룰 수밖에 없구나'하고 피울음을 내뱉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와 부딪힙니다. 이 시모음 <여성해방출사표> 머리말에서 말했듯 '여성해방'에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운동가는 사회 전체 틀을 보지 않으려 하고, '노동해방' 목소리를 높이는 운동가는 '몰여성'에 빠져 있다는 것.
"황진이가 이옥봉에게"라는 시 가운데 실은 짤막한 시로 "가을편지"가 있습니다.
송악의 가을을 나는 사랑했기에
송악의 명월이라 이름했지요
명월은 세 가지 원칙을 가졌어요
절대로 얼굴에 화장하지 않으며
절대로 남자 앞에 치장하지 않으며
근본이 맑아야 마주앉는 일
그 누구 이 원칙에 손을 댈 수 있으리요
번화하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으며
비록 관부의 주석이라도 다만
빗질과 세수만 하고 나갈 뿐
옷도 바꾸어 입지 않았습니다
......
명월이 말한 세 가지 원칙. 이 원칙은 여성들 스스로 갖추면 좋을 원칙임을 넘어 남성들에게도, 아니 우리들 모두에게도 아름다울 원칙이라고 느낍니다. 겉꾸밈을 넘어 마음과 자기 됨됨이 바탕을 깨끗하고 맑게 가꾸는 일. 이렇게 우리가 저마다 자기 스스로를 가꾸며 지낸다면 '여성해방', 또는 '노동해방', 또는 '사람해방', 또는 옹근 평화와 민주와 자주와 자유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닦이'도 즐겁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정희씨는 시에서 바로 이것을 말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길닦이'로 가는 우리들 마음가짐과 움직임을 말이지요.
3.
1991년에 세상을 떠난 고정희씨. 어느덧 열두 해가 지났군요. 지난 열두 해가 지난 지금 '여성해방'이든 '남녀평등'이든 '자유와 민주와 통일'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많이 나아졌는지요? 아니면 뒷걸음질을 쳤는지요? 잘 모르겠는지요?
다만, 고정희씨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1991년보다 지금은 훨씬 민주주의를 우리 힘으로 이루어냈고, 그 어떤 시인이 그 어떤 목소리로 외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정희씨와 또 다른 고정희 씨가 시에서 외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꼬여 있고 풀리기 어려운 매듭처럼 묶여 있습니다.
| | | 고정희 시인은 어떤 사람? | | | |
1991년 지리산에서 조난을 당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시인 고정희. 그이는 그동안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1979)>, <실락원 기행(1981)>, <초혼제(1983)>, <이 시대의 아벨(1983)>, <눈물꽃(1986)>, <지리산의 봄(1987)>,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1989)>, <광주의 눈물비(1990)>, <아름다운 사람 하나(1991)>,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1992)> 같은 시모음을 펴냈습니다.
올곧은 마음과 치우치지 않은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애틋한 사랑시, 여성시, 사람 살아가는 알뜰한 시를 썼던 고정희 시인입니다. / 최종규 | | | | |
지금은 '완성'이 아니라 '징검다리'입니다.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징검다리이며 시행착오도 있는 때입니다. 가끔씩 샛길로 새거나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호주제 문제에서도 '법과 제도'로서 호주제도 문제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깃든 '마음속의 호주제'도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거나 없애도 우리가 '올곧고 아름다운 법과 제도'를 실천에 옮기고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과 됨됨이가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성해방출사표>라는 시모음에 부록처럼 붙인 그때그때 써 주었다는 시 가운데 "여성사 연구" 여섯 꼭지가 있습니다. 이 "여성사 연구" 가운데 5편인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가슴에 징하게 울려옵니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여성해방출사표>를 읽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헌책방이나 도서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모음 <여성해방출사표>입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 씨
맞벌이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