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엄마, 아기 똥 쌌나 봐. 똥 냄새나."둘째가 코를 틀어쥐고 인상을 쓰며 나를 불렀다. 똥이야 매일 싸는 일 아닌가? 다만 그 날은 셋째 토요일로 나에겐 한 달 중 가장 바쁜 날인 게 좀 달랐을 뿐이다.
셋째 토요일엔 월간 <작은책>의 글쓰기모임이 있었다. 모임은 합정동에서 오후 4시에 열린다. 우리 집에서 가려면 1시간 40분은 넘게 걸린다. 오후 2시 20분까지 글 한 편 마무리하고 식구들 점심 주고, 저녁 먹을거리까지 준비해놓고 집에서 출발하자면 시간이 빠듯하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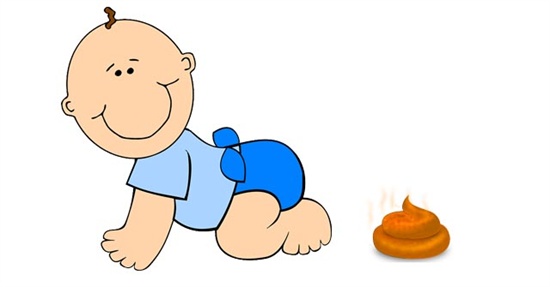
|
| ▲ 아기가 똥을 매일 싸는 일 아닌가? 다만 그 날은 달랐다.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나는 똥이 들어 있는 아이의 바지를 살살 벗겼다. 똥이 떨어질까 봐 벗긴 바지를 잘 싸서 한 손에 들었다. 다른 손으론 아이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바닥엔 어제 물을 준 난 화분이 있었다. 화분에서 물이 다 빠지면 베란다로 옮길 생각으로 화장실에 두었는데, 마음에 좀 걸렸다. '셋째 녀석이 화분을 깨뜨리면 어쩌나?' 걱정되었다. 바지에 들어 있는 똥을 변기에 털었다.
"잠깐만 화장실에 있어." 나는 똥 묻은 바지를 베란다에 있는 빨래 삶는 통에 넣으려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바지를 통에 넣고 잽싸게 화장실로 돌아오는데 "퍽" 하는 소리가 났다. 화장실에 오니 걱정했던 대로 난 화분이 깨져 있었다. 화장실 바닥엔 화분 속에 있던 작은 돌이 쏟아져 있다. 안 그래도 바쁜데 할 일이 하나 늘었다.
나는 아이에게 "이게 뭐야?" 하고 물었지만, 셋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똥말똥 날 쳐다보았다. 둘째에게 신문지와 봉투를 가져오게 해서 깨진 화분과 부스러기들을 비닐 봉투에 담았다. 봉투에 담긴 난 화분을 급한 대로 베란다에 옮겨 놓고 화장실로 돌아왔다. 셋째 아이는 화장실 문틀을 양손으로 잡고는 한쪽 발을 앞뒤로 흔들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온수를 틀어서 바가지에 물을 가득 받았다. 이제 아이를 닦아 주려고 돌아섰는데…, 바로 옆에 있던 아이가 안 보였다. '아니 이 녀석이 어딜 갔지? 똥 묻은 엉덩이를 해 가지고.'
거실을 내다보았다.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는 공기를 하고 있고, 막내는 둘째가 공기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거실에 철퍼덕 앉아서. 엉덩이엔 똥이 그대로인데…. 미치겠다. 거실 바닥은 이미 화장실에서 아이가 앉은 자리까지 누런 똥 도장이 찍혀있다. '으으윽 최악이다. 최악.'
"야! 똥도 안 닦았는데, 거실에 나와 앉아 있으면 어떡해?"나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왔다. 글쓰기모임에 가려면 녀석이 사고를 안 쳐도 시간이 빠듯하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고까지 치다니…. 화분 깬 것만 해도 참을 만했다. 그런데 이건 수습이 쉽지 않겠다. 정말. 막내 녀석은 내 큰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뭘 어쨌다고?' 하는 순진한 표정이다.
"너 거기 가만히 있어."엄마가 바쁜 날은 어찌 저리 귀신같이 알까? 똥 자국을 요리조리 피해 녀석에게 갔다. 아이 옆구리에 양손을 끼고 아이를 높이 들었다. 어설프게 들었다가는 내 몸에 똥이 묻을지 모른다. 그리고 화장실에 내려놓았다. 자세히 보니 아주 다리 쪽은 똥범벅이다. 엉덩이 고추 허벅지 발까지 모두 다 똥이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도대체 언제쯤 집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머리가 멍했다.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거실을 먼저 치울지. 아이를 먼저 닦일지. 거실을 먼저 닦으면 똥 묻은 아이가 다른 곳으로 돌아다녀서 안 되고 아이를 먼저 닦으면 깨끗해진 아이가 똥 천지 거실을 돌아다녀서 안 될 거 같았다. 방법이 없다. 쉬는 날이면 집에선 잠만 자는 남편을 깨우는 수밖에.
"여보, 잠깐만 일어나 봐. 비상이야! 비상. 막내가 똥도 안 닦았는데, 거실에 앉아서 지금 거실이 똥 자국 천지야 빨리 일어나.""당신이 치우면 되지. 날 왜 깨워?" 예상했던 답이다.
"내가 애 닦이고 거실에 내놓으면 거실 똥이 애한테 다시 묻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거실 똥 좀 치워 줘." "그럼, 내가 아이 닦일게."눈부셔 눈도 못 뜨는 남편이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왔다.
"아빠가 우리 막둥이 때문에 쉬질 못해요."시간은 벌써 오후 1시 30분. 거실 똥 치우고 점심 차리고 밥 먹고 나 씻고 저녁까지 준비해 놓고 나면 도대체 몇 시쯤 집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거실의 똥을 닦는데 똥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 '이 짜식 뭘 먹었길래 똥냄새가 이렇게 심한 거야?' 결국 난 그날 모임에 지각을 했다.
벌써 5년 전 일이다. 그렇게 거실을 똥천지로 만들었던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글쓰기모임에 나가고 있다. 생각해 보니 내가 글쓰기모임에 꾸준히 나가도록 도움을 준 일등 공신은 막내랑 막내를 나 대신 돌봐 준 첫째랑 둘째다. 늦었지만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