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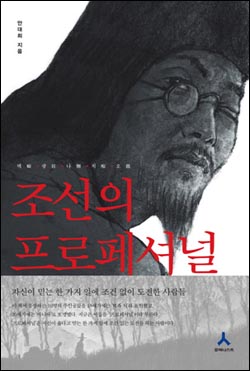 |  | | | ▲ <조선의 프로페셔널> 겉그림. | | | ⓒ 휴머니스트 | 내 기억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은 조훈현, 이창호 그리고 이세돌이다. 그들을 일컬어 흔히 '국수'(國手)라 한다. 우리나라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제일 잘 두는 이들을 향해 부르는 말이다.
물론 바둑 분야에만 국수가 있는 게 아니다. 화가에도 있고, 서예가에도 있고, 성악가에도 있고, 무용가에도 있고, 그리고 원예가에도 있다. 또 굳이 붙인다면 여행가에도 있을 것이고, 과학기술자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조선시대에는 어떠했을까? 그때에 떠오르는 국수로는 누가 있을까? 익히 아는 사람으로는 화가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가 번뜩 떠오고, 음악가에는 박연과 황진이가 생각난다.
안대회가 쓴 <조선의 프로페셔널>은 바로 그 시대의 최고 국수들을 조명한 책이다. 케케묵은 검은 문헌 속에서 모두 10개 분야, 10명의 국수를 되살려 놓은 책이다.
"이 책은 200년 전 한국사회에서 그런 순수함을 느끼게 하는 프로들을 발굴하여 조명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옛 문헌들을 좌충우돌 뒤져서,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고귀한 인간과 그들의 치열한 삶을 이 세상으로 불러내고자 합니다." - 지은이의 말
사실 조선시대에는 신분상의 제약이 심했고, 직업의 귀천도 분명했다. 그 까닭에 의식이나 지향하는 바도 한 방향으로 흐른 게 사실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과 신분이 숙명인 듯 여겼다. 그러니 당대 주류였던 선비들은 과거급제가 목표였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밥줄을 연명하고 사는 게 제일이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다른 분야를 개척해 내는 일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직업과 신분을 내팽개치고,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해진 틀을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일탈이나 반항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 최고 '국수'들이 모였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프로페셔널은 거의 지배집단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조선의 다빈치로 불리는 '정철조'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중인이나 평민, 천민이나 기생에 속한다. 그만큼 신분이나 지역 등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 모두가 얼마나 당찬 패기로 살았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바둑기사 '정운창'을 들여다보자. 그는 전라도 보성출신으로서 백제시대 이후 조선시대에까지 흐르고 있는 바둑의 최고 혈맥을 이어받았다. 그는 사촌 형으로부터 바둑을 배운 이후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지냈다. 더욱이 전라도 근방에서 바둑계를 평정한 이후에는 서울로 진출하여 당대 최고의 국수들과 경합을 벌였다.
"바둑판에서 무명의 기사가 당대의 국수와 단번에 대결을 벌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정운창은 꾀를 내어 명성이 드높은 국수와 한판 승부를 겨룬다. 그리고 이겼다. 시골뜨기 청년이 하루아침에 서울의 바둑계에 찬란하게 등장하는 순간이다."(71쪽)
이는 금성현령으로 있던 '정박'을 내리 세 판이나 이긴 장면이다. 그 여세를 몰아 그는 '김종귀'가 있는 평양으로 올라가 그곳에서도 멋진 승리를 거머쥔다. 그야말로 무명의 시골뜨기였던 그가 조선의 제일로 군림하던 김종귀에게 완승을 거둔 셈이다.
또 한 사람의 프로페셔널이 있다. 조선 최고의 출판마케터라 할 수 있는 '조신선'이 그다. 당시 조선에서는 서점을 통해 책을 사고파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서책의 공급과 수요가 양반 사대부 계층에 집중돼 있었고, 조정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모든 지식의 공급과 유통이 국가에 의해 관장됐던 것.
조신선은 그 틈 사이를 비집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연결했던 사람이다. 그를 일컬어 '서쾌(書儈)' 또는 '책쾌(冊儈)'라 불렀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을 일컬어 '가쾌(家儈)' 또는 '사쾌(舍儈)'라고 부른데서 연유한 말이다. 그가 동네에 나타나면 '책쾌 조씨가 왔다'는 말이 순식간에 퍼졌다.
조선 최고의 출판마케터 '책쾌' 조신선
놀라운 것은 책쾌 조씨는 단순한 책장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제자백가를 비롯해, 문목(問目)과 의례(儀禮)등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었으니, 이를 위해 얼마나 갈고 닦았을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약용은 온갖 서적에 대해 술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그를 군자(君子)로 착각했던 것이리라.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학자들에게 꿀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야말로 책을 천하에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세는 당당하고 도도하다. 조신선은 책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책을 아는 천하 사람 가운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고 오만하게 말한 것이다."(243쪽)
더욱이 그는 책을 파는 장수답지 않게 저잣거리로, 골목으로, 서당으로, 관청으로 늘 바쁘게 뛰어다녔다. 위로는 높은 벼슬아치로부터 아래로는 소학(小學)을 읽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의 책쾌가 되었다. 발이 부르트지 않고서는 책에 관한 한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될 수는 없었으리라.
그 밖에도 이 책에는 보산 동래의 평민출신에서 일약 최고의 과학기술자로 부상한 최천약을 비롯해, 경상도 밀양의 기생 운심, 황진이와 인연을 맺고 살았던 음악가 김성기, 스스로 종놈임을 밝히면서도 누구에도 뒤지지 않았던 시인 이단전 등 다양한 국수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무튼 200년 전 조선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국수'가 되기 위해 품었던 열정과 패기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운명처럼 정해진 틀을 박차고 나갔던 그들의 열정과 중심 세력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섰던 그 패기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