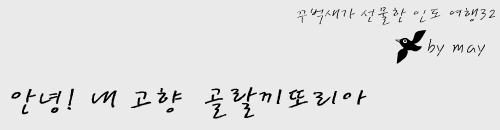
ⓒ 왕소희
![[집에 놀러온 동네 소녀들]](https://ojsfile.ohmynews.com/down/images/1/tikis_328800_13[581154].jpg)
▲[집에 놀러온 동네 소녀들] ⓒ 왕소희
내 진흙집에는 몇 마리 동물이 살고 있었다. 먼저 하얀색 아기고양이 네 마리. 내가 마을에 처음 온 날 추위를 못이기고 문 밑으로 기어들어 왔던 녀석들이다. 낮에 빈집 헛간 문아래서 검은 코를 봤던 기억이 나서 반가웠다. 그리고 녀석들 볼을 비비며 첫 날의 어색함을 달랬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다음 날 추위가 가시자 바로 집을 떠나 버렸다.
@BRI@그리고 마이스. 마이스는 밤마다 내 비스킷을 딱 하나씩만 먹고 가는 쥐였다. 이 녀석은 너무 작은 쥐라서 비스킷 하나 이상은 먹지도 못했다. 하지만 정말 배가 고플 때는 그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검둥이. 검둥이는 스스로 애견이 되기를 자청한 강아지다.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와 이불에 벌렁 누워 네다리를 휘저으며 귀여운 나 좀 봐달라는 듯 애교를 떨었다. 그렇게 녀석이 다가와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말라비틀어진 강아지 검둥이는 벼룩투성이였다. 지니는 매일 개벼룩을 잡아주었지만 난 달랐다. 화가 나면 발로 쫓고 비스킷도 잘 주지 않았다. 며칠 뒤 검둥이는 어디선가 흰둥이를 데려왔다. 바둑돌도 아니고 흰둥이, 검둥이라니.
'아무리 그래봤자 검둥이 너는 귀엽지가 않아!'
난 검둥이가 귀찮았다. 고양이와 쥐와 강아지. 난 이 집에 함께 살았던 동물들을 떠올리며 아무튼 짐을 싸야했다. 오늘 골랄끼또리아를 떠날 것이다. 나의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다.
구석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여행신발이 보였다.
'여기선 한 번도 이 신발을 신은 적이 없군.'
곧 서글픈 생각이 들어 난 유난히도 신발을 꼭 끌어안았다. 그런데. 그런데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신발을 내려놓고 털어 보았다. 대굴, 신발 안에서 똥이 굴러 떨어졌다. 거기에 똥이 있었다. 검둥이 똥.
검둥이의 복수는 치밀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발 안에 똥이 있었는지 똥은 화석이 되었고 냄새는 신발에 골고루 배었다. 이 좁은 신발 안에 어떻게 똥을 쌌을까? 검둥이는 정말로 복수가 하고 싶었던 거다.
'검둥이, 내가 졌다. 그리고 너는 좋겠다. 나 오늘 오르차를 떠나거든.'
양철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 되도록 재빨리 골목을 벗어났다. 35L짜리 검은색 배낭을 들쳐 멨지만 되도록이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가슴 뻐근한 이별 식을 치르고 싶지가 않았다.
"메이!"
깜짝 놀라 돌아섰을 때 흙 위에 앉아 있는 아기 깔루가 보였다. 깔루가 나를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말하는 것 자체를 거의 보지 못했다.
'내 이름을 알고 있었구나.'
깔루와 나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네시가 배낭을 자전거에 실어 주었다. 우리는 매일 걸어 다녔던 길을 뒤로 하고 있었다. 이 따가운 햇살, 지평선 끝에 서 있는 앵무새 나무, 골목을 돌 때마다 나타나는 익숙한 풍경들, 무엇보다도 언덕.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뒤 돌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바이삽!"
나는 곧장 오르차 시내의 순리 바이삽 가게로 찾아갔다. 구아바 두 봉지를 사들고서.
"바이삽, 나… 지금 가요."
나는 순리 바이삽에게 만 떠난다는 말을 했었다. 바이삽은 얼른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오면 나를 끌어안았다.
"메이, 만약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난 평생 너를 미워할 거야."
순간 나는 바이삽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의 발에 손을 갖다 대며 인도식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경찰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우리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던 바이삽.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https://ojsfile.ohmynews.com/down/images/1/tikis_328800_13[581155].jpg)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 한승희
![[언덕 중간길]](https://ojsfile.ohmynews.com/down/images/1/tikis_328800_13[581156].jpg)
▲[언덕 중간길] ⓒ 한승희
![[언덕 꼭대기]](https://ojsfile.ohmynews.com/down/images/1/tikis_328800_13[581157].jpg)
▲[언덕 꼭대기] ⓒ 한승희
사실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았다. 경찰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허가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음악 쇼를 위한 허가서를 받고 언덕을 기증 받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역시 인도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일을 마무리 지을 방법을 찾아보자는 희망을 품은 채 헤어져야 했다.
"잘 가, 한 달 뒤에 카트만두에서 만나!"
지니와 나는 껴안았다. 내가 해 본 것 중 가장 깊은 포옹. 내 팔에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모두 실어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우리가 함께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다. 지니도 며칠 뒤에 오르차를 떠날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람과 나는 가봐야 할 곳이 있었다. 마투라. 크리슈나의 탄생지로 유명한 이 땅에 우리는 볼 일이 좀 있었던 것이다.
![[언덕 위의 아이들]](https://ojsfile.ohmynews.com/down/images/1/tikis_328800_13[581158].jpg)
▲[언덕 위의 아이들] ⓒ 왕소희
밤 기차가 마투라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있었다. 창 밖을 보고 있는데 문득 오르차를 떠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막막함과 서글픔이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뒤로 돌지도 못하고 창문에 딱 붙어 있어야했다.
오르차가 멀어지고 있었다. 내 고향 오르차, 우리 마을 골랄끼또리아, 그리고 나의 진흙집. 안녕.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게.

ⓒ 왕소희
덧붙이는 글 | 앞으로 3편 정도 연재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재밌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편도 즐겁게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