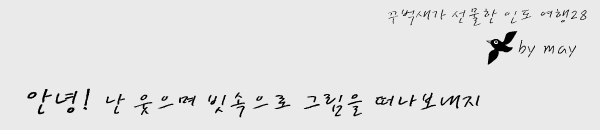
ⓒ 왕소희

▲별궁으로 가는 길 ⓒ 왕소희
독수리를 보기위해 찾아간 왕녀의 별궁에서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친구 빠로왓을 소리쳐 불렀다. 테라스에 있다가 깜짝 놀라 달려온 그에게 흥분하며 말했다.
"이것 봐! 이 그림!"
식당 주인인 그와 지하우물을 둘러본 뒤 농장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자항기르마할의 별궁에 들렀을 때였다. 별 생각 없이 간 그곳에서 나는 한 그림을 보았다. 아니 그림이 나를 찾아냈다!

▲오른쪽 여인이 내가 좋아한 그림 ⓒ 왕소희
눈앞에 있는 이 그림은 오래 전부터 내가 굉장히 빠져있던 그림이었다.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보다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내가 그린 것처럼.
바로 노트를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다.
'언덕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걸 보고 언덕 아래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위로 올라와 줄지도 몰라!'
내 손은 마치 수백 번은 그려본 것처럼 거침이 없었다.
다음날부터 언덕위에서 페인팅 작업이 시작되었다.
"공작새 눈은 흰 색으로 칠해!"
팔짱을 끼고 내 그림을 노려보던 동네 화가 라자가 말했다. 그는 나를 못마땅해 했다.
"이 색깔은 틀렸어. 인도 공작새 눈은 흰색이야. 넌 언덕에서 돌아다니는 공작새도 못 봤냐!"
"동물원 공작새는 노란색이거든!"
"거짓말!"
"정말이야. 동물원이 답답해서 눈이 노랗게 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트집을 잡는 그가 나도 싫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동네 사람들이 뒤에 늘어서 환호를 했다.
"아차헤! 아차헤!(좋다)"
"넌 천재야!"
하늘 끝까지 으쓱해진 나는 심각한 얼굴로 실눈을 뜨고 내 그림을 바라보며 멋진 척을 했다.

▲바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 ⓒ 왕소희

▲바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 ⓒ 왕소희
라자는 화가 났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최고의 그림쟁이였던 그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그림을 그리러 오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과 놀러만 다녔다.
난 라자 몫까지 그림을 그리느라 언덕 위에 개미처럼 붙어 지내야했다. 그때 신기하게도 미술을 전공한 여행자들이 언덕에 나타났다. 그들은 언덕 위 사원에 가네시, 하누만, 붓다 등 신(god)의 그림을 그렸다.
"쑨달 나가라이!(아름다워)"
"보후트 쑨달헤!(너무 아름답다)"
내 뒤에 늘어섰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탄성을 질렀다.

▲언덕위 작은 사원에 하누만(원숭이 신)을 그리고 있는 여행자 ⓒ 왕소희

▲언덕위 작은 사원에 가네쉬(코끼리 신)를 그리는 여행자 ⓒ 왕소희
이번엔 내가 화가 났다. 난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전문가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 작업이 끝나고 붓을 씻을 때마다 내 그림을 싹 지우고 싶었다. 완벽한 그림 옆에서 내 그림은 초라해 보였다.
며칠 뒤 한 여행자가 언덕에 올라왔다. 언덕을 구경하러 왔다던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성벽위에 서서 땀을 쩔쩔 흘리며 그림을 그리는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저기, 이것들 몬순(계절풍에 의한 우기) 때 다 지워질 텐데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그려?"
뭐야!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왜 여행 와서 일을 하고 있어? 여행을 왔으면 놀아야지."
뭐라고?
"그리고 여기 만든 길도 몬순 때 싹 쓸려 없어질걸?"
잘났다.
억지로 화를 참고 있던 나는 그가 사라지자마자 람에게 물었다.
"몬순 때 그림이 다 지워지진 않겠지? 여긴 몬순 없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지워지지. 전부 비에 씻겨 나갈 걸? 게다가 우린 진흙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하지만 괜찮아. 내년에 다시 그리면 돼."
괜찮긴! 그럼 뭐 하러 그려! 몬순 때 모든 게 사라진다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했다. 나는 붓과 물통을 집어 던지고 바위 그늘 밑에 주저앉았다. 내년이면 내 그림은 다시 진흙이 된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 왕소희
그늘에 앉아 있는 동안 땀이 식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언덕, 밤이 되면 서쪽으로 날아가는 새떼들,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원숭이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미누가 끌고 온 자전거, 내 발밑에 흙. 그리고 나. 모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졌다. 왠지 그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사실 나는 라자와 경쟁할 필요도, 다른 그림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도 없었는데.
노을이 질 때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룽기(인도 남자 전통 옷) 하나만 걸친 노인하나가 휘청 휘청 언덕으로 올라왔다. 숨이 찬 듯 여러 번 멈추며 걷기를 반복한 노인은 언덕 위 사원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곤 우리들이 그린 신(god) 그림에 이마를 대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했다. 노인은 잘 그리고 못 그린 그림을 따질 생각 따윈 없어 보였다. 그에게 그건 그림이 아니라 신이었다. 노인은 차례차례 모든 신 그림위에 경배했다. 그리고 다시 휘청 휘청 언덕을 내려갔다.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뿌듯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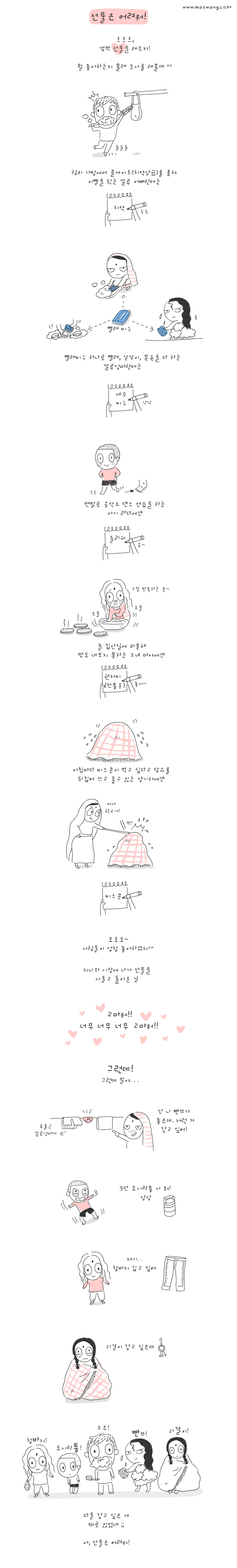
ⓒ 왕소희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 다음, 행복닷컴, mayw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