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우리 마을 꼬마들의 모임에 싱겁게 끼어드는 어른이 있었다. 이제 생각하면 우리보다 열 살쯤 많은 형뻘이었지만 그때의 호칭은 아저씨였던 것 같다. 그 아저씨는 여름밤에 통과의례를 마치고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 할 즈음 가끔 나타났다.
그리고선 재미있는 이야기와 무서운 이야기를 끼워가며 해줬다. 몇은 터무니없고 몇은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였다. 그것들 중 여우 사냥 이야기를 잊을 수 없다. 바로 이야기 내용 그대로 실제 행동으로 옮긴 애들 중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여우 사냥 이야기'는 이렇다.
여우란 놈은 항상 밤에 공동묘지에 나타나는데 아무 멧등(‘뫼’의 사투리)에 가지 않고 반드시 새로 생긴 멧등에 가서 그 멧등을 파헤치고 시신을 뜯어먹는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여 여우를 잡는다는 거였다.
준비는 해질 무렵부터 진행된다. 밤에 가면 여우란 놈이 하도 영리해 통하지 않으니 해질 무렵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공동묘지에 올라가 새로 생긴 멧등을 찾아 상석(床石 : 무덤 앞에 제물을 차릴 수 있게 놓인 사각형의 돌)에 눕는다.
 | | | ▲ 두 개의 무덤 상석에 나란히 누웠다 | | | ⓒ 정판수 | | 최소한 두 시간을 그리 가만 누워 있으면 드디어 여우란 놈이 나타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부터는 숨소리도 내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멧등 앞에 누워 있는 물체(?)가 죽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놈은 절대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경계를 하던 놈이 드디어 사람의 몸 위를 뛰어넘으며 생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하도 번개 같이 뛰어넘기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다.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놈의 속도가 느려진다.
드디어 놈의 움직임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느려졌다고 여겨지는 순간, 두 손으로 배 위로 뛰어넘는 놈의 뒷발을 잡아서는 힘차게 휘둘러 때기장친다(내동댕이친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
이때 절대로 앞발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앞발을 잡으면 순간적으로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우에게 물리면 사람은 살아 있으나 혼을 빼가기 때문에 혼 나간 사람이 되어 밤마다 몽유병 환자처럼 나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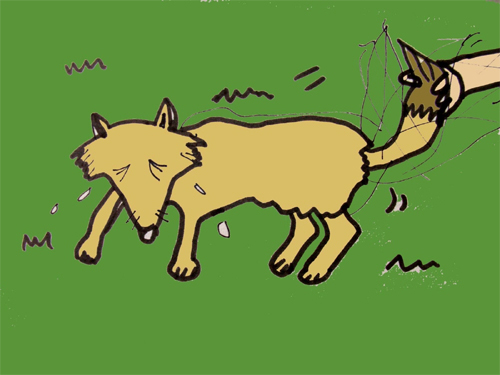 | | | ▲ 꼬리를 잡고 내동댕이쳤다. 사실은 뒷다리를 잡아야 했는데... | | | ⓒ 정판수 | | 그 아저씨가 얼마나 이 얘기를 실감나게 했던지 우리는 진짜 여우를 잡을 수 있다고 느꼈다. 더욱이 그 아저씨가 던진 미끼가 그럴싸했다. 여우 가죽은 돈이 된다는 것. 그것도 거금을 만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골목대장이었다. 며칠 뒤 나를 은밀히 부르더니 여우 사냥 이야기를 환기시킨 뒤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말 “너 그러면 가시나로 만든다” 하는 말에 그만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서야 했다.
다음날 밤 공동묘지에 올랐다. 부모님에게는 친구집에 숙제하러 간다고 하고선. 대장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인지 훨씬 덜 무서웠다. 며칠 전 같은 나이의 명찬이와 함께.
‘진짜 사나이’를 부르며 악을 쓰고 올랐을 때보다 훨씬 덜 무서웠다. 아니 이번엔 ‘진짜 사나이’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무섭지 않았다.
마침내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새로 생긴 무덤이 있었다. 대장이 오른쪽에 누우면서 왼쪽에 나를 눕게 했다. 무덤 앞에 두 명의 꼬마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무서웠지만 무섭지 않았다. 대장이 있기에. 특히 대장이 여우가 내 위 아닌 자기 위로 오게 할 비책이 있다고 했기에.
그러다가 갑자기 혹 여우가 대장 위가 아닌 내 위로 오면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무서움증이 일었다. 옆으로 보며 대장에게 뭔가 말하려 할 때 그의 눈이 날카로워지면서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수직으로 대는 게 아닌가.
나는 끽 소리를 못하고 자세를 바로 했다. 불알이 오그라들었다. 뭔가 나타나는 낌새를 대장이 알아차렸다고 봤다. 그 놈이 내게로 온다면…. 내 몸은 안정된 자세로 누워 있었지만 잔떨림은 그칠 줄 몰랐다.
그때였다. 갑자기 대장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나도 오줌을 지리며 일어남과 동시에 피할 방향을 찾으려 재빨리 둘러봤다. 그런데 대장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닌가. 그 바람에 밀려 둘은 나뒹굴었다.
“뭐… 뭐… 뭐야?”
나의 떨리는 소리에 대장도 떨리는 소리로 답했다.
“배… 배… 뱀.”
 | | | ▲ 여우 대신 나타난 뱀에 놀라 달아났다 | | | ⓒ 정판수 | |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장이 누워 있던 자리에 그렇게 기다리던(?) 여우는 오지 않고 뱀이 스물스물 바지 위를 건너 왔던가 보다. 뭔가 낌새를 느껴 잔뜩 긴장해 있는데 뱀이 자기 바지 위를 건너 기어왔으니….
이제 생각해보니 그 뱀은 혹 그 무덤을 지킬 능구렁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름 끝에 들려주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의 두 번째는 끝이 났다.
덧붙이는 글 | 제 블로그 ‘달내마을 이야기’에 나오는 ‘달내마을’은 경주시 양남면 월천마을을 달 ‘月’과 내 ‘川’으로 우리말로 풀어 썼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다래골(다래가 많이 나오는 마을)’ 또는 ‘달내골’로 불리어졌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