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6·15 남북공동선언문 중>
6·15 공동선언문은 비전향장기수 서옥렬 선생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역시 마찬가지다. 분단 아래 조국을 사랑한 죄 값이 너무 가혹했던 그의 삶. 반평생을 통일을 위해 살아왔던 그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사형'소리 여섯 번이나 들었지"
서옥렬 선생은 과거를 떠올리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조국을 사랑했기에 남파했다는 그의 사연은 험난했던 한반도의 역사를 닮아있었다. '사형'소리만 1심에서 6번 들었으나 최종판결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고 1961년 9월부터 1990년까지 29년간 옥살이를 한 그였다.
'사형'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당시 얼떨떨하기만 했다는 그.
 | | | ▲ "얼른 북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지만 더 좋은 것은 통일 되서 모두 다 함께 하는 거지."비전향장기수 서옥렬 선생의 웃음은 괴로움을 잊기 위한 방법이 아닌 희망의 상징물이다. | | | ⓒ 전대기련 | | "조금 지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길래 물 달라 해서 땀 닦고 시원해서 웃었더니 같이 지내던 사람이 나보고 어찌됐냐고 묻는거야. 사형선고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거짓말 말라고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동안의 그의 웃음은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인 듯 했다. 혼자 누우면 꽉 차는 1평도 안 되는 독방에서 29년을 보낸 서 선생은 1990년 출옥했으나 후에도 그의 삶엔 자유란 없었다. 보호관찰법에 의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으며 항상 감시를 받아야했다.
"반공법이 없어지긴 했지만 반공법 조항이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그대로 삽입돼 있지."
삶의 반절을 국가보안법의 탄압 속에서 살았던 그는 자신의 삶보다, 서로가 하나임을 알면서도 적으로 여기며 살아야했던 역사를 더욱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통일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고 항상 웃었다고 한다.
"자식 두명. 보고싶지. 안 보고 싶을리 있나."
그는 29년을 독방에서 지낸 비전향 장기수였고 출옥 후에는 16년을 혼자 지낸 이산가족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반세기가 지나서야 이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2000년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 때가 그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2차, 3차 송환이 이어질 것이라 믿었고, 아직 통일을 위해 이남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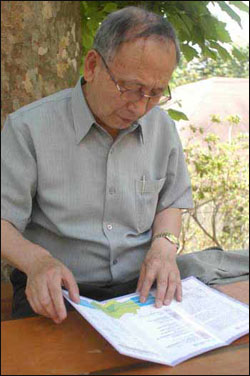 | | | ▲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일정을 살피는 서옥렬 선생. 그에게 민족통일대축전은 단순한 남북교류의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 | | ⓒ 전대기련 | 그러나 그 후 서 선생은 2005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장기수 2차 송환의사를 밝혀 송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까지 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송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6월 27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하면 무슨 얘기 나오겠지. 실망이 크지만 기다려야지."
그는 오늘도 송환을 준비한다.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이남에서 맺었던 인연들과의 기억을 담아가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얼른 북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지만 더 좋은 것은 통일 되서 모두 다 함께 하는 거지."
이제 그에게 웃음은 괴로움을 잊기 위한 방법이 아닌 희망의 상징물이다. 북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희망, 통일이 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희망. 그래서 그는 오늘도 웃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중의 소리>에 송고됐으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홈페이지(unip.or.kr)에 실려 있습니다. 전대기련 공동기사입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