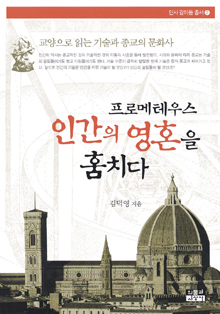
▲책 겉그림 ⓒ 인물과 사상사
인간의 역사는 종교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사이에서 발전해 왔다. 시대와 문화가 변해감에 따라 종교는 기술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었다가도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신화와 주술의 힘을 빌려 이 땅을 다스릴 때에는 종교가 기술을 통제하면서 나름대로 발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성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에 들어선 뒤 종교와 기술은 다툼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급격히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선 기술 자체가 종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는 듯 보인다. 종교가 기술을 통제할 수 있었던 옛 시대만 해도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을 악마로까지 단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막강한 기술’이란 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종교가 마치 악마처럼 비쳐진다. 이러한 때 종교와 기술은 서로 어떤 관계를 그려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러한 물음에 답을 주는 책이 있다. 김덕영의 <프로메테우스 인간의 영혼을 훔치다>(인물과사상사·2006)가 그것이다.
"이 책은 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다양한 사회적 차원들 가운데 종교가 기술에 대해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술에 대한 종교사회학이 되면서 기술의 문화사가 되는 셈이다."(머리말)
고대세계에서 인간들은 땅을 다스려갈 때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술의 힘을 빌렸다. 주술은 언뜻 보면 그래서 종교와 유사한 점이 많다. 종교처럼 주술도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바라는 바를 얻었기 때문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종교는 인간보다 우월한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만, 주술은 신과 같은 인격적 주체를 다루고 제어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모습을 두고 볼 때 주술 역시 하나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사물을 매개하는 역할로서 주술이 서 있고, 거기에는 현대기술처럼 그 당시의 다양한 수단과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주문이나 기도와 같은 정신적인 요소 이외에도 주술적인 약품이나 새의 깃털 같은 동물 신체의 일부분, 그리고 마스크나 장신구, 지팡이, 칼 같은 여러 도구들을 동원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교적 행위와 같은 그 주술을 행하면서,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기술 발전을 꾀해 왔음에도 '프로메테우스'에게 늘 짓눌려 왔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세계에 불을 훔쳐다 주었고, 제우스는 그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세상 끝에 묶어두고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아 먹게 하는 벌을 내렸다는데, 불과 같은 기술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죽어버린 듯한 프로메테우스는 근대에서 파우스트로 부활하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멋진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른바 프로메테우스가 해방된 것이다. 그만큼 신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는 신들이 창조한 세상의 질서까지 뒤흔들어 놓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신마저 떠나보내고, 이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우뚝 서 있는 꼴이다.
그 분기점을 어느 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종교로부터 기술이 해방된 시점, 종교와 기술의 간격 차, 그 소원해진 시점을 어느 기점으로 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 1의 혁명인 농업혁명이 지나고, 제 2의 혁명인 산업혁명을 그 기점으로 볼 수 있다. 그 때부터 기술이 종교의 자리를 꾀 차게 된 것이고, 종교는 기술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논리나 방법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
그 뒤, 루터의 뒤를 이은 칼뱅의 종교개혁에 접어들면서 종교와 기술이 서로 디딤돌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자본이라는 막강한 권력 아래에 종교는 기술을 위한 허울 좋은 끄나풀에 불과했다. 그리고 칼뱅의 종교개혁 정신은 청교도 신앙으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그것은 미국의 개척정신과 실용주의 노선에 힘을 보태 준다. 하지만 신의 영광과 인간의 복된 삶이라는 신앙적인 덕목은 점차 빠지고, 자본주의가 미국 사회 전체를 휩쓸 무렵에는 이미 청교도적인 요소는 탈색된 지 오래였다. 그저 자본주의 정신과 기술개발의 정신만 남게 될 뿐이었다.
그리하여 이성이라는 '전지전능한' 지적 능력과 도구를 소유한 창조주인 인간은 무한대의 기술 개발과 혁신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때문에 기술발전의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야누스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지만, 아무튼 인간은 자연을 창조한 설계도이자 암호인 신의 유전자 지도까지도 훔쳐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곧 생명 창조의 과정에까지 진입할 단계에 이르렀으니, 기술은 막강한 종교 그 자체가 된지 오래이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파우스트인지도 모른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고, 생명공학이라는 거대한 재앙의 씨앗을 손에 넣은 파우스트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생명공학 기술과 더불어 위험사회의 범위는 더욱 더 확장되고 그 심도는 더욱 더 깊어지고 있으며, 그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202쪽)
그렇듯 기술이 곧 종교가 되어 무한 질주하는 '기술다신주의 시대'에 종교는 기술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술이라는 막강한 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종교가 자칫 악마로 남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예전처럼 종교가 다시금 기술보다 우위를 점하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면서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최상의 가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됐든 예전에도 그랬듯이 종교와 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때론 디딤돌로 때론 걸림돌로 존재할 것이다. 다만 종교는 무조건적으로 기술에 대해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기술을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역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합리성,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회적 합리성의 관계에 주어져 있지 않는가 싶다. 종교는 과학과 기술의 합리성에 대해, 그 사회를 이끄는 합리성에 대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게 그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비판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단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