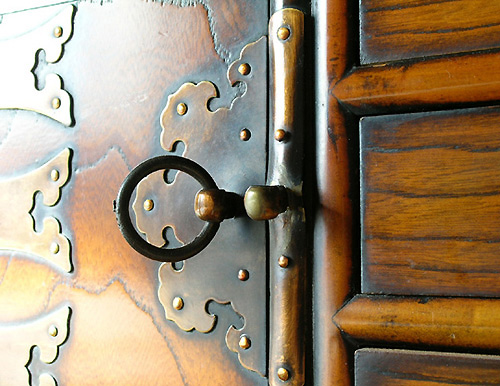 | | | ▲ 어린 날, 내 기억의 편린 속으로 | | | ⓒ 한지숙 | |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신 어머니는 손재주가 아주 많은 분이었다. 퇴근길에 동대문 시장에 들러 주섬주섬 옷감 몇 가지 사들고 와, "우두커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면 뭐하니, 귀로 들으면 되지…"하며 드르륵 재봉틀 돌려 원피스 한 장 뚝딱 만들어 입고 아침에 출근하던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다.
어릴 때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난 요술옷들을 입고 온동네를 휘젓고 다녔다. 입 안에서 질겅거리던 껌 속에 갖가지 크레용을 잘게 부수어 무지개 빛 컬러껌을 씹던 그 시절. 내 기억의 편린 속, 집안 구석구석에 흩어진 자잘한 옷감 조각들은 컬러껌의 매력만큼이나 잊을 수 없는 빛깔의 조화다.
그때는 옷감 조각 나뒹굴고 실밥 묻어나는 것이 왜 그리 싫었는지, 게을러서 청소하기 싫어서라기보다 쓸고 닦아도 늘 재봉틀로 무언가 만들던 어머니 취미 덕에 집안은 깔끔할 새 없었다.
하도 잔소리를 해대는 나 때문에 커다란 냉장고 상자에 자잘한 조각들을 슬쩍 꾸겨넣곤 하던 어머니. 요즘의 내 사는 모양새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엄마 딸 아니랄까봐…' 코웃음치는 언니의 말을 떠올리면 웃음도 나고 가슴 한켠이 뭉클하다.
 | | | ▲ 삐뚤빼뚤 투박한 손맛 | | | ⓒ 한지숙 | | "왜 모자만 만들어요?"
사람들이 묻는다.
"재봉틀 쓰면 빠르고 매끄러울 걸 왜 손바느질로……?"
사람들이 또 묻는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곰곰이 그 생각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딱히 정답이 없다. "모자가 좋으니까!", "재봉틀을 다룰 줄 몰라서"라고 대답하면 쉽게들 또 이어 말한다.
"배우면 되지, 간단해, 쉬워!"
배우러도 다녀 봤고, 개량 한복 몇 조각 잇는 작업도 해봤지만 이젠 제법 익숙한 손바느질보다 재미가 없어 포기했다. 한 땀 한 땀 이어갈 때마다 마주 어우러져 흐르는 잔잔한 고요를, 삐뚤빼뚤 투박해도 손끝에 닿는 오묘한 질감의 손맛을, 작업하는 내내 마음 속, 머릿속을 웅웅거리는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한껏 자유로울 수 있음을 남들이 어찌 알까.
"자기 옷 정도는 만들어 입으면 좋지 않겠니, 집안도 손수 꾸밀 수 있어 재미있고…."
억지로 재봉틀 앞에 끌어다 앉히려는 어머니의 손길도 징그러워 도망다니던 나.
 | | | ▲ 유쾌한 놀이, '즐기며 만들기' | | | ⓒ 한지숙 | | 지금은 전공에서 많이 벗어난 길, 손으로 꼼지락거리며 노는 수공예를 취미로 즐겼을 뿐인데, 더군다나 손바느질을 하고 그것으로 소품을 만들며 살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귀농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머니를 생각한다. 당신의 유쾌한 놀이였던 '즐기며 만들기', 우리들의 꿈을 키워주고 집안을 개성있게 꾸며가던 어머니의 손때 묻은 추억들을 끄집어내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나누련다.
"엄마, 내가 말야, 손바느질하면서 살아요……!"
덧붙이는 글 | 어머니 살아생전, 당신의 덕과 복을 이해하지 못한 못난 딸입니다. 내 삶의 앞날을 꾸려가며 어머님이 즐기시던 것들을 조금씩 따라해 보는 요즘, 한없이 짠한 마음으로 이 글을 바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