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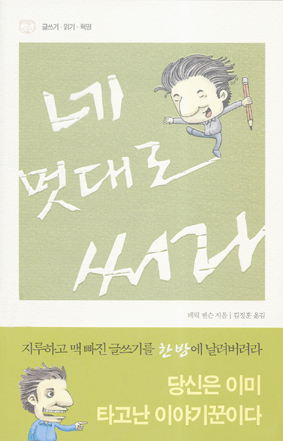 |  | | | ▲ 책 표지 | | | ⓒ 삼인출판사 | “단 하나의 배움은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제 것으로 만든 배움뿐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인 글쓰기 선생 데릭 젠슨은 말한다.
거기서 선생인 자기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보살펴주는 것뿐이다. 더 좋은 글을 써내라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 이전에 “너 자신이 되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되지 않고서는 글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써놓은 글이 얼마나 지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루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바로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읽는 이들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질. 그래서 최소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섹스하는 것보다(이게 별로 재미없다면 다른 거라도) 재미없는 일이라면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젠슨이 말하는 글쓰기의 다섯 가지 규칙은 읽는 사람을 지루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
이 책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다. 몸통은 글쓰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수업 풍경이다.
이 수업의 현장에서는 감추어둔 학생들의 비밀과 상처가 드러나고, 감옥 안 마약중독자는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드는 그림을 그린다. 또 선생의 산업 문명과 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일장 연설과 전복적인 물음과 실천들에 골이 나고 저항하는 학생들, 그들의 무감각과 온갖 편견들도 솟구쳐 나온다. 그러면서 변해가는 학생들, 글을 쓰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무성한 줄기를 뻗어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데릭 젠슨이 보기에 안타깝게도 “예의 차리는 사람. 붙임성 좋은 사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등급 매기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강한 의견, 모든 강한 충동 앞에서 얼버무리는 사람은 지랄같이 가치 있는 걸 쓸 줄 모른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얼굴 위에 언제나 쓰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권위 있는 인물들 앞에서, 특히 우리 속에 있는 비평가 앞에서 ‘지랄’이라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한 힘껏 자기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된다.”
돈을 벌러 일하러 나가야 하고, 학교에 나가야 하고……갖가지 의무에 시달리며 자신의 삶을 연기하고 있지만,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산업사회 속에서 마음을 다친 이들에게 데릭 젠슨은 크나큰 위로를 준다.
“행복해져도 괜찮아, 네 삶을 네가 원하는 방식 꼭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일자리를 안 얻어도 괜찮아. 일자리를 결코 얻지 않아도 괜찮아. 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뭔지 알아내려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걸 얻으려고 싸워도 좋아. 네가 누군지 발견해내는 일에 네 삶을 다 쏟아 붓는 거야.”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학생들에게, 제도 교육과 사회체제에 상처받은 채 펜을 든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한 저자의 간절한 목소리다.
애들을 가만히 놔둬라-그래도 괜찮으니까
역사가이자 시민운동가인 하워드 진은 “모든 사범대학과 교육학과에서는 교과서와 필수 교과과정을 치워버려라. 대신 이 책 <네 멋대로 써라>를 한 권씩 안겨주어라. 이 책은 선생들과 학생 모두에게 배움이 뭔지 하나하나 들어 말해주고 있는 아주 뛰어난 책이다.”라고 이 책을 상찬했다.
데릭 젠슨은 이렇게 묻는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 대부분은 제시간에 맞춰 일을 시작하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며, 끝마치는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기로 되어있다. 우리는 다섯 시 정각이 될 때까지, 금요일이 될 때까지, 월급날이 될 때까지, 은퇴 때까지, 우리가 유치원, 보육원, 탁아소에 가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마침내 다시 우리 것이 될 때까지 초를 세면서 시계를 봐야만 하기로 되어있다. 우리는 이런 온갖 기다리는 일을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걸까?” 그의 대답은, 학교다.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못하게 해 이 체제에 봉사하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제도 교육이라는 것이다.
데릭 젠슨의 감동적인 면모는 그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것도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필연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학교와 교실 현장의 끔찍함에 분통을 터트리는 데에서 나타난다.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기고 출석을 체크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싸안고 학생들과 풀어가는 모습조차 그의 특유한 유머를 동반한다. 그는 글쓰기의 다섯 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몸소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우리 반 사람들은, 나도 포함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용기만 북돋아주면 된다. 누가 마음을 쏟아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 자신의 크나큰 가슴으로 자라나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우리는 외적인 시간표로 관리될 필요가 없고, 무엇을 언제 배워야 되는지도,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지도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네 멋대로 써라>는 바로 선생 일에 맥 빠져 지긋지긋해진 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모든 선생님들은 이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다루려는 모든 시도에서 일단 손을 떼는 거다.
이 책 곳곳에 짙게 배어있는 제도 교육에 대한 데릭 젠슨의 분노는 이 학교가 바로 사회의 반영이라는 데에서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 대한 부정과 저항으로 이어진다. 삶을 빼앗겨 한없이 소심해지고 두려움에 차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이들에게 데릭 젠슨은 이렇게 거듭 묻는다. “넌 누구니? 넌 누구냐니까?”하고. 이 물음은 내 마음을 많이 흔든다.
이런 것들은 뭔가 훌륭한 걸 쓰거나 뭔가 훌륭한 걸 말하기 위해서 굉장한 뭔가를 꾸며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시도다.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한 힘껏 자기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데릭 젠슨은 삶에는 딱 하나의 가르침이 있고, 글쓰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일인데, 다름 아닌 우리 가슴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 그것은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한 행동이고, 이전에 자신이었다고 생각되는―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누구‘이었던’―모습에서 지금 저들 자신인 모습으로 발을 디뎌 건너가는 소박한 행동들이다. 거기엔 기적에 버금가는 용기가 들어있다.
자신이 되는 일에 크나 큰 두려움으로 길들여진 많은 이들을 위해서 데릭 젠슨은 이 책을 쓴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