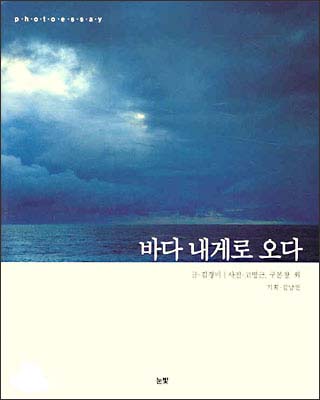
▲<바다 내게로 오다> 책 표지 ⓒ 눈빛
일상이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굴러갈 때 저는 구본창, 배병우, 정주하 등 스물아홉 명의 사진가들이 건져올린 바다 사진들과 김경미 시인이 쓴 산문들을 한데 묶은 포토 에세이 <바다 내게로 오다>를 읽곤 합니다.
김경미 시인은 198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비망록'이 당선되며 문단에 등단한 이후 <쓰다 만 편지인들 다시 못 쓰랴> <이기적인 슬픔들을 위하여> <쉬잇, 나의 세컨드는> 등의 시집을 낸 중견 시인이지요.
우리는 종종 사진집을 읽을 때 글이 사진의 깊이를 못 따라간다거나 글이 사진과 따로 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적어도 그런 점으로부터는 비껴나 있는 듯합니다.
시인은 일부러 특정 사진에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 들지 않고 그저 그의 개인적인 삶을 차분하게 이야기해나갈 뿐이지만, 그녀의 글은 절대로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들과의 유기적인 협동 관계를 흐트러트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만이 가진 은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한 편의 시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의 한 자락을 깊은 바다에 담그고 스스럼없이 자신의 삶의 빛깔을 바다에 풀어 버립니다.
짙은 하늘 파랑, 밝은 하늘 파랑, 옅은 푸른빛 녹색, 짙은 검은 빛을 띤 남빛, 푸른빛 회색 파랑, 옥수수꽃 파랑 등 온갖 바다색에 맞추어 이야기도 갖가지 빛깔로 변주돼 갑니다.
바다는 일탈하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것
책의 첫머리에서 시인은 우리가 왜 그렇게 바다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일상이 십 원짜리 동전처럼 구차하고 초라할 때, 사랑이 단지 상처이거나 모욕일 때, 마음만큼 잘 안 되는 일과 칫솔컵만한 인간관계가 절망스럽고 쓸쓸할 때, 그럴 때면 언제나 문득 바다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보들레르가 "자유인이여, 언제나 너는 바다를 사랑하리"라고 노래했다면, 우리는 "일상인이여, 나는 언제나 바다를 그리워하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바다는 일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떠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말 없이 훌쩍 떠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인은 늦은 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에서의 일화를 얘기합니다.

▲황규백 작 <바다> ⓒ 황규백
한 시간마다 오는 버스를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정거장 윗쪽에 내리는 사람만 얼른 내려놓더니 도망가듯이 그대로 가 버렸지요. 어떤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 회사에 항의하겠다고 하고, 다시 또 한 시간을 더 기다릴 것인지 택시라도 탈 것인지를 의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삼 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똑같은 버스가 또 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 시간마다 오게 돼 있는 버스가 이삼 분만에 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다시금 차도 앞으로 나가 섰습니다. 저 버스도 그냥 가 버리는 거 아니야,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버스는 정확히 정거장에 와 섰습니다. 그때 정거장 앞으로 나가던 오십대의, 수더분해 보이는 한 아줌마가 한마디했습니다.
"말없이 그냥 떠나는 것들한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라니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오십대 아줌마를 돌아봤습니다. 잠언이니 아포리즘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것 같은 중년의 수더분한 아줌마의 표정 속에는 살면서 얻은, 그 어떤 고급스런 학식에도 견줄 수 없는 생의 철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생의 목표가 너무 낮으면 삶이 무료해지고...
시인은 젊었을 때 자주 바다에 빠져 죽는 꿈을 꾸곤 했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문학이라는 높디 높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뇌이기도 합니다.
가끔 혼자 기지개를 켜다가 그 자세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뻗어 올리면 간절히 소원하는 것에 가 닿는다...... 나도 조금만 더, 조금만 하면 빚도 좀 갚을 수 있으려나... 하긴 그 조금만이 실은 진짜 '조금만'이 아니라 때론 '다'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맨끝의 '조금만'은 '아홉쯤'인 것입니다.

▲임안나 작 <바다의 전설> ⓒ 임안나
그런 시인이긴 하지만 그이라고 내가 요즘 밥값이나마 제대로 하고 살고 있나 생각할 때가 아주 없겠습니까. 그이 역시 "엎질러진 물바다에 살면서 다시 또 번번히 컵에 물을 담아 보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바깥에 내가 있을 때
인생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치부해버려도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 그렇게 후회는 남기 마련입니다.
너무 마음 바깥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나 내게 도움이 되거나 정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닌 떠드썩한 파티장. 거기에서 과장된 제스처를 써 가면서 피아노의 검정 건반처럼 계속 반즘 샾된 목소리를 냈던 건 아닌지.
시인은 자신만의 스케줄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의 묵언 기간, 자기만의 하안거가 있는 마음의 심해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할는지요? 마음의 바깥에서 마음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역설적으로 고립과 소외를 뜻할 수도 있으니까요.
'화를 내려면 슬퍼져요'라는 소제목 속의 글 속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미덥다고 말합니다. 화란 날 것 그대로의 가장 솔직하고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시인에겐 화를 내는 일이 자신을 마음 바깥에 두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고명근 작 < wator-3> ⓒ 고명근
몸 속에 바다가 있다
시인은 멕시코에 사는 언니네 부부에게서 1m가 좀 넘을 길고 가는 대나무 원통 하나를 선물 받습니다. 태평양의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잡아 넣은 통이라면서 말입니다. 거꾸로 들 때마다 쏴아 혹은 차르륵, 태평양까지는 모르겠지만 계곡물 소리 같기도 하고 대숲을 누비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울려나오는 통.
시인은 어딘가 가고 싶어지면 그걸 위 아래로 연신 쏟아 봅니다. 그 통 속에선 마치 푸른 색의 파도가 넘실대며 흘러나오고 해풍이 불어오는 듯싶습니다.
마침내 시인은 그 통 속에서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된 것일까요? "삶이라는, 그리고 나라는 형편없이 작고 좁은 제한된 통. 그 통 안에도 끝없이 드넓은 바다가 있으리라 믿어봅니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니까요.
바다는 언제 내게로 다가오는가
다시 책의 첫머리에 쓰여진 시인의 서문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바다가 내게로 올 때는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다가 내게로 올 때는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일 거라는 시인의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무릎을 탁, 내리칩니다. 그리고 시인의 말을 조금 더 긍정하기 위하여 시인의 말을 조심스럽게 바꿔 봅니다. "내가 느닷없이 바다가 그리울 때는 내 마음 속에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일 겁니다"라고 말입니다.
바다에 가고 싶다 혹은 바다가 그립다 하는 생각은 그냥 맹목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뭔가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뜻이지요.

▲최병관 작 <내 안의 바다> ⓒ 최병관
시인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군요. 어둠이 밀려오는 밤바다를 지켜보면서 울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정말이지 삶은 알지 못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처럼 어둠이 밀려오는 밤바다를 지켜보면서 울어 보기 위해 바다로 떠날 수도 없고, 그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안겨주는 답답함이 가슴을 메울 때 저는 책장에서 <바다 내게로 오다>를 대신 꺼내 읽습니다.
한번은 친구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창가 쪽으로 앉은 아들이 갑자기 '비상시 문을 여세요'라고 쓰인 문을 열려고 낑낑댔답니다. 친구는 놀라서 무슨 짖이냐고 막 야단을 쳤죠. 그러자 아들은 경고글이 써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여기 "문을 여세요"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건데, 하면서 억울해 하더랍니다.
그러고 보니 '비상시' 세 글자는 한자였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아이로서는 읽을 수 없는 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고글은 아이에겐 정반대의 문을 열라는 경고가 됐던 것입니다.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보일, 모르는 사람에겐 정반대로 읽혀질 생의 경고나 비법들, 흰 도화지에 초로 쓴 글씨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열심히 배워 익히고 깨우친 사람에게는 보일, 생의 비상시에 바로 열고 나갈 수 있는 구원의 표지판이나 지시어들.
시각적인 청량감을 안겨 주는 여든 컷이 넘는 바다 사진들과 함께 김경미 시인의 차분한 글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 새 일상으로부터 달아나 저 만치 바다에 한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비록 생의 비상시에 바로 열고 나갈 수 있는 구원의 표지판이나 지시어들까지는 볼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덧붙이는 글 | 책이름 : <바다 내게로 오다>
저자 : 김경미
출판사 : 눈빛
가격 :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