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의 주체성>, 이 두 권의 저서는 철학의 보편화·대중화를 위해 우리 현실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를 알기 쉽게 관련시켜 풀어낸 문고판 형식의 책이다. 책의 양이 기타의 철학서에 비해 적고 쉽기 때문에 읽기에 부담이 적다. 내용 또한 찬반양론에 입각해서 저자의 주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 철학서로는 보기 드물게 현실 의식을 두드러지게 갖춘 책이다.
저자는 최근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철학서를 펴내고 있는 탁석산이라는 중견 철학자이다. 학계보다는 대중매체와 대중들을 위한 쉽고도 현실감 있는 철학서를 많이 펴냄으로써 차츰 그 명성을 얻고 있다.
최근 우리는 내부적으로 친일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핵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면한 문제들이 모두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두 권의 저서는 이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진 책이기에 일독의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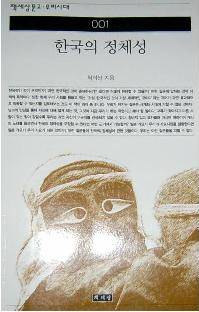 |  | | | ▲ 한국의 정체성 표지 | | | ⓒ 책세상 | <한국의 정체성>은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저자는 제기한다. 여기에서 한국은 약소국이면서 문화 후진국임을 제기한다.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우리 존재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의 당위성이라 함은 “우리가 우리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역설할 수 있어야 함을 문제삼는 것이다.
저자는 정체성의 근거로 대중성, 현재성, 주체성을 들고 있다. 특히 보편자의 허구성 대신에 개별자의 구체성을 강조하는 현재성 부분은, 그의 전공이 흄 철학인 것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대중성의 근거에서는 '소수만 향유하는 판소리 대신 조용필의 노래가 더 한국적이다'라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한다.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해 최근 친일청산 문제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친일청산은 “한국은 한국이다”라는 존재 당위의 문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친일청산을 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난날 일제의 침략과 국권수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이 한국이기 위해서는 지난날 타민족의 침입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역사적 필연성이 내재하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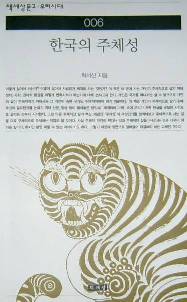 | | | ▲ 한국의 주체성 표지 | | | ⓒ 책세상 | <한국의 주체성>은 우리 행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주체성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주인은 자신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한다는 것, 둘째, 입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인은 손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셋째, 주인은 자신의 독립과 자존감을 위협받을 때, 이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체성>에서 저자는 우리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내면화, 핵무장, 세계화'를 들고, 주체적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글전용, 국가 기반 시설 지키기, 할 말은 하자”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무장과 한글전용 문제만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핵무장과 관련해, 우리가 몇 십 년 전 실시한 간단한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질책 아닌 질책의 소리와 원망을 듣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민족인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에서 오는 국제사회의 이목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핵에 대한 실험과 기술 축적을 하겠다는 소박한 저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원성의 소리에 대해 한 마디 변명도 제대로 못 하고 다 감수해야만 하는가 하는 울분마저 가지게 된다.
한글전용도 우리 주체적 입장에서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 세계에 우리 문자 만큼 독창적인 문자를 가진 나라가 있던가? 문자를 가지고 부려 쓸 수 있었다 함은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능력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진정한 우리가 우리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역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권의 저서는 위의 우리 현실 문제를 우리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판단해 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일부의 주장이 지나치게 주관적 피상적인 색체가 짙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 우리가 우리이고, 우리이어야 함을 '정체성'과 '주체성'의 관점으로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담론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저서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