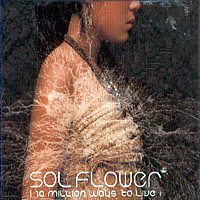
▲솔 플라워의 데뷔음반 <10 Million Ways to Live> ⓒ
서론이 길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네오 소울을 표방하는 신인 여가수 솔 플라워의 데뷔 음반 <10 Million Ways To Live>이 퍽이나 마음에 든다. 특히 인트로를 제외한 처음의 두 곡 'Kiss The Kids'와 '끝까지 친구'는 근래 주류 가요계에서 내놓은 음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레게 리듬을 기저에 깔고 어쿠스틱 기타와 덤덤한 솔 플라워의 보컬이 어우러지는 'Kiss The Kids' 그리고 섬세한 코드 보이싱과 독특하게 싱코페이트된 리듬이 돋보이는 '끝까지 친구'를 듣고도 이 음반에 좋은 인상을 갖지 않기란 힘들 것이다.
과장되지 않은 정갈한 사운드와 사랑 타령에서 탈피한 노랫말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울풀한 조원선' 혹은 '발랄한 임현정'처럼 들리는 솔 플라워의 보컬이 좋다. 뭐랄까, 그동안 수없이 보아온 '목청만 좋은' 디바들과는 달라 보인다. 무심한 듯, 담담한 듯 관조적으로 나직하게 부르는 솔 플라워의 보컬은 이 음반에 호감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아이러니, 솔 플라워에 대한 호감이 슬쩍 흔들리는 것도 역시 보컬 때문이라니. 솔 플라워 역시도 '한국식 R&B'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지는 못하고 있다. 변진섭 시절에서 한 걸음도 발전하지 않은 발라드를 '풍부한 성량'과 '바이브레이션'으로 불러놓고 ‘한국적 R&B’라고 우기는 그 악습 말이다. 그래서, 초반부의 네오 소울 곡들에서 힘을 빼고 가볍게 부를 때는 더없이 신선하게만 들리던 목소리가, 상투적인 발라드곡 'Calling'이나 블루스 기타가 좌지우지하는 'Another Day'에서는 빛을 잃고 마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런 ‘가요’와 친근한 곡들은 한결같이 사랑타령으로 가득한 노랫말을 자랑한다. 클리셰에 클리셰를 더한 형국이다.
하지만 음반을 끝까지 듣고 난 뒤에 남는 감정은, 역시 호감 쪽에 가깝다. 아쉬운 트랙이 몇 있기는 하지만 ‘한국 블랙뮤직의 대모’ 박선주와의 듀엣곡인 'Mother'나 '세상, 그 중심의 나'와 같은 빼어난 곡들이 곳곳에 포진한 까닭이다. 이런 노래들에서는 솔 플라워의 장점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성대의 힘을 뺀 목소리는 그녀가 존경한다는 인디아 아리의 그것만큼이나 매력적이고, 입양아나 우정, 여성주의에 관한 노랫말 또한 가요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다. 그렇다고 휘성이나 이효리의 음반처럼 영미 팝 음악을 ‘번안’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근거가 있지만, 일단은 여러 트랙의 밑바닥에 레게 리듬이 양념처럼 깔려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련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몇몇 곡에서 음색이 ‘완연히’ 뒤바뀌는 문제점은 신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사소한’ 부분일 것이다.
솔 플라워의 이 음반은, 네오 소울이라는 신선한 요소와 한국식 흑인음악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신인인 탓에’ 완전히 네오 소울 쪽으로 ‘올인’하기는 힘들었던 것일까? 미련은, 역시 무섭다. 그래서 나는, 솔 플라워의 다음 음반에 더 큰 기대를 걸기로 한다. 데뷔 음반이 보여준 가능성으로 미루어, 다음 작업에서는 무언가 해낼 것도 같다. 영미 팝 음악의 ‘개작’도 ‘번안’도 아닌, 독창적인 음악 말이다.
물론 이것은 ‘한국식’ R&B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은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마치 <그랑블루> 포스터도, 절름발이 책상 다 버리고 말끔하게 정리된 내 집 거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