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뽕잎 갉아먹고 있는 누에 ⓒ 대한잠사협회
누에치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되짚으며
춘궁기에 돈을 만져볼 방법은 고사리 꺾는 일이 있지만 목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가욋돈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다. 식구가 최대로 늘어난 1970년대 중반 농사짓는 집 치고 보리농사, 벼농사를 주로 하는 2모작을 하지 않은 집이 없었고 잠시 틈만 있으면 삼베의 재료인 대마(大麻)를 재배하여 길쌈하고, 누에치는 양잠(養蠶)하고, 겨울에는 땔나무를 해와서 한 구루마 씩 내다 팔아 1년 내내 농한기가 거의 없게 지내야만 대가족이 입에 풀칠이라도 해서 연명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많아 ‘뭐 하려고 그리 많이 낳았어요?’라는 말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나오지 않는 집이 없게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마는?
하여튼 1976년 누에고치의 생산량은 유사이래 최고 치인 4.2만 톤에 이르렀다가 1994년 이후에는 1천 톤 미만으로 급격히 줄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하던 때 이미 지게를 지고 다닌 경력이 2~3년은 되었으니 농사짓는 것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 분양 받아 온 누에가 스무날 가량이면 다 커버리니 못자리 할 시기와 맞물려 한 동안은 허리가 휘어진다. 며칠 지나면 보리 베어 타작을 해내야 하고 모내기를 해야하니 ‘바쁘다’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날이 흐리나 비가 오나 맑으나 뽕을 따다 하루 서너 차례에서 대여섯 번은 줘야하니 남녀노소 식구들이 모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급할 때는 (*1)‘놉’까지 얻어다 써야 했다.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은 지게를 지고 가서 뽕나무 가지를 낫으로 툭 잘라서 하루 서너 번 한 짐 씩 지고 와야 했고, 어머니와 누이는 부대자루를 들고 가서 차곡차곡 눌러 뽕잎을 가득 따서 담아 이고 와야 한다.
갓 깨어난 까만 개미누에가 드글드글 모여 있는 모습은 벌레들의 야단법석 그 자체다. 누에치기는 그 작고 여린 누에가 깨어나면 본격 시작된다. 어린 뽕잎을 자그맣게 잘라 조그만 상자, 요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기르다가 몸집이 커짐에 따라 급격히 불어난 누에를 방마다 양쪽으로 3층집을 지어 공간을 넉넉하게 하여 20여 일 기르면 8cm 크기의 가운데 손가락 길이 만큼 되는 큼지막한 참깨 벌레 정도의 곤충이 뽕잎 먹기를 그치고 누렇게 된다.
몸 속에 들어있는 파란 누에똥까지 들여다보이게 투명해지면 약간은 습한 실을 입으로 슬슬 뱉어내는지 밀어내는지 모르지만 한 올 한 올 뽑아 거미줄 치듯 시작하여 이틀이 안되어 어느새 하얗게 제 집을 지어 고치 속에 들어가 안주(安住)한다. 한 짬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입을 놀려 집 짓는 품새를 한참 골똘히 지켜보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수매 날이 되어 1등급 맞아서 돌아오시는 어머니는 ‘오지다’며 입이 함지박만 하게 턱 벌어졌다.
누에치기는 40대 쯤 되는 아저씨들에게는 한 민족에게 무수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선사했다. 어머니의 허리가 휘고 아버지는 물꼬 보느라 쉴 틈도 없었다. 어린 우리들은 ‘오디’ 하나 따먹는 재미로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누에치기 양잠은 나에게도 각별하다.

▲먹기 좋은 뽕잎 ⓒ 김규환
날마다 서너 번은 뽕잎 따러 가야했다.
밭이 널찍한 집은 뽕 걱정이 별로 없었다. 내가 살았던 백아산 언저리는 그리 넓지 않은 농토를 가진 지역이라 밭이면 적당한 곳에 물길을 끌어다 죄다 논으로 만들었다. 그나마 남은밭이란 밭은 띄엄띄엄 줄을 지어 뽕나무를 심고 뽕나무 사이사이에 콩을 조금 섞어 심을 뿐이었다. 하지만 밭이 없는 집은 산을 개척하여 뽕나무를 심었으니 우리집도 왕복 십리나 되는 먼 곳에 만들 수밖에 없었다.
신새벽에 뽕잎 주는 것은 학교 다니는 우리들 차지였고 그 시각에 어른들은 차일봉 (*2)‘산몰랭이’가 지척인 밭에 가서 한 짐씩 뭉떵 지고 내려오신다. 산길을 달음박질하여 날마다 오르내려야만 했다.
학교 갔다와서는 형제들도 합류를 한다. 두 잠 잘 때까지는 굳이 여럿이서 지게를 지고 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각자 지게를 지고 따라 나서야 한다. 봄비를 맞아 작년에 넣어준 퇴비와 고형비료 기운을 받아 치렁치렁 탐스레 쑥쑥 자란 뽕 잎은 쌈 싸 먹으면 딱 좋다 싶게 부드럽고 널찍하다. 어른 손바닥으로도 가리기 힘들고 줄기도 두껍게 자라 보통 무게가 아니다.
사람 다니기도 벅찬 소로(小路)는 나뭇가지와 높다란 논두렁에 뽕나무가 걸려 초보자는 쉽지 않지만 약간 비스듬히 몸을 틀어 탄력을 받아 뛰어 내려오면 걸려 넘어질 염려까지는 없었다. 학교가지 않는 날에는 하루 세 번을 다녀봐서 안다. 그 고단한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집에 와서는 누에에게 뽕 잎 주고 틈만 나면 집집마다 소를 길렀던 때라 다 베어가고 없는 꼴을 찾아 헤매야 했다.
비 오는 날이라고 그냥 배 깔고 누워 있을 수 없다. 누에가 비 내린다고 먹기를 그칠 리 없쟎은가? 커 감에 따라 먹는 양이 하루가 다르게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것이니 쉬 감당하기 힘들다. 뽕나무가 더 잘 자라기는 했지만 그런 날도 비를 쫄딱 맞으면서 뽕나무를 베어와야 하니 그 무게는 갠 날에 비해 두 배는 족히 되었다. 한 번 쉴 요량으로 길가에 잠시 앉아 쉴 참에 남부끄러워 슬며시 어디고 밀어대면 온 몸에서 부슬비를 맞아 겨우내 씻지 않았던 때가 탱탱 불어 보리밥처럼 한 줌씩 쉽게 모아졌다.
석 잠을 자고 나서는 뽕이 부족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밭에 있는 것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겹다. 그 때는 수가 없다. 어디에 있을 지도 모르는 뽕을 찾아 산으로 들어가서 뽕을 따와야 한다. 잎을 쭉쭉 훑어 주섬주섬 주워 담고는 달음질로 산을 내려와야 굶겨 죽이지 않았다.
산뽕나무는 잎 크기도 작을뿐더러 따기도 수월치 않다. 최하 5미터에서 10미터에 이르는 높이에 매달린 잎을 어찌 생각같이 쉽게 딴 단 말인가? 그래도 길은 있는 법. 얇고 기다란 나무를 하나 베어 꽁지에 낫을 칡넝쿨 하나 떠서 칭칭 감아 매달아 끌어내린다. 마음만 바빴지 얼마나 더딜까?
산뽕이라도 만나면 그래도 다행이었다. 산뽕을 이미 부지런한 다른 사람이 따가고 (*2-1)‘천신’이 돌아올 턱이 없으니 그 때는 세상에 나무 가시가 이렇게 크고 억셀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여 엄나무 가시보다도 더한 (*3)‘꾸지뽕나무’ 가시를 잡고 꾸지뽕 잎을 따다 주는 수밖에 없었다.
이도 저도 안되면 어른들은 여유 있는 집을 찾아가 하루 품을 팔기로 하고 뽕을 얻어다 먹였다. 아이들 젖 얻어다 주는 것도 모자라 뽕까지 동냥을 했으니 얼마나 애가 탔을까? 애 기르기나 농사는 부모 마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가 보다.

▲누에 섶에 누에를 올립니다. 올리기 전에 목욕도 시키고 소독도 해야하네요. ⓒ 김규환
‘사각사각’ ‘서걱서걱’ ‘스걱스걱’ 하다 “슥슥”, “썩썩”, “쓱쓱” 소리내면 뽕잎 대기 바빴다
우리집은 해마다 봄누에 두 매 반(*글쓴이 註; 한 매는 보통 시골에서 썼던 소주 깍쟁이로 한 잔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양이다. 요즘으로 보면 2잔 반 분량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을 쳤다.
첫날 종자를 가져왔을 때 효모알갱이나 좁쌀 만한 작은 크기인데 하루 이틀 지날 작시면 까만 벌레들이 꼼지락꼼지락 일어서 깨어난다. 하루 이틀 지나면 잘라 준 세작(細雀) 여린 뽕을 먹고 차차 하얗게 된다.
알에서 부화되어 나왔을 때 크기는 3mm이던 것이 뽕잎을 먹고 성장하여 4령(齡)잠을 자고 5령(齡)이 되면 급속히 자라서 8cm 정도가 된다. 뽕잎을 먹고 쑥쑥 커 가는 그 모습, 이제 상상으로 밖에 그릴 수 없다. 파란 뽕잎에 올라타서 덕지덕지 붙어 “자각자각” 긁어먹는 그 아름다운 소리. 미처 뽕 잎을 따주기도 힘들어 가지 째 툭 던져주면 금새 하얗게 올라타 뽕잎과 잎자루도 야금야금 먹어댔다.
자랄수록 먹는 양과 먹는 소리도 달라진다. 서너 배까지 먹어대고 먹는 소리는 “사각사각” “서걱서걱” “스걱스걱” 하다가 “슥슥”, “썩썩”, “쓱쓱”으로 바뀐다. 종이 부대자루를 쥐가 “드윽득 득득” 긁어대는 듯한 소리가 온 방안에 퍼져 거슬리지 않게 동시에 수십만 마리의 협연이 이루어진다. 간혹 밑으로 떨어진 걸 주워서 올려주는데 징그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었다.

▲누에고치 멋지지 않습니까? ⓒ 대한잠사협회
좌로 한 땀, 우로 한 땀, 천장 쪽으로 한 땀, 바닥에도 한 땀 날줄 씨줄을 섞어 고루 점찍듯 입방아를 찧어 잣아 나가...
네 번 잠을 자고 5령 말까지의 유충기간 일수는 보통 20일이니 그 성장 속도는 대단하다. 그 때가 되면 뽕 먹기를 멈춘다. 어느 정도 자라 더 이상 크지 않고 쭈그러들면서 뱃속에 있는 파란 똥까지 보이는 누렇고 투명에 가까울 때 고치를 짓기 시작한다.
이 때를 보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짚으로 만든 섶이나 솔가지를 꺾어다 큼지막한 누에를 올리면 좌로 한 땀, 우로 한 땀, 천장 쪽으로 한 땀, 바닥에도 한 땀 날줄 씨줄을 섞어 고루 점찍듯 입방아를 찧어 잣아 나가면 처음에는 물에 잠긴 듯한 습(濕)한 줄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다가 잠시 오줌누느라 밖에 나갔다 와서 다시 보면 ‘섬섬옥섬(纖纖玉纖)’ 하얀 타원형의 고치를 만들어 호기심 많은 내 우뇌(右腦)를 유난히도 건드려 주었다. 이틀 반 지나면 하얀 고치를 만들어 줬으니 어머니 몰래 한 두 개 가지고 나와 구슬치기하며 놀았던 기억이 아련하다.

▲즐겨 따먹던 오디. 오둘개가 더 정감있지 않습니까? ⓒ 김규환
누에치던 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 싸한 냄새가 온몸에 절었다.
누에를 치려면 먼저 호롱과 벽시계만 남기고 방안에 있던 뒤주와 요강, 화로, 이불도 급할 때 덮고 잘 것만 빼고 당장 쓸모 없는 것을 모두 밖으로 치워 채비를 해야 한다. 시렁과 시렁 사이에 길고 튼튼한 대를 이리저리 가로 세로 질러 고정하여 베로 묶어 집을 짓는다. 채반으로 받히고 위에 사료 부대를 뜯어 종이를 깔고 위에 누에가 살기 좋게 한다.
첫날부터 장작을 매워 방안 기온이 25도에서 28도로 유지되게 하고 습도도 80~90% 까지 높인다. 그야말로 찜통이 따로 없다. 스무날을 그렇게 더운데서 같이 잔다. 속 편히 잠자기는 누에가 잠자는 네 번이나 가능하다.
먹는 양이 늘어감에 따라 푸르댕댕한 똥을 지네들 보다 더 수북히 깔겨대니 똥 치우기도 만만한 게 아니었다. 누에똥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결같이 주름이 잡힌 모양이었다. 말라비틀어지면 “또르르” 바닥으로 굴러 내려와 방안 곳곳이 누에똥 천지가 되었다. 그래도 1룩스 정도의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모든 일은 이뤄졌다.
차차 기온을 내려주기는 하지만 바깥 대낮 기온보다 5~6도는 높고 밤에는 10도 이상 차이가 있었으니 잠이라고 제대로 올 리 만무하다. 이런 곳에서 누에똥을 한쪽으로 대강 밀고 눕고 잠자는데 온 몸에 누에 똥 냄새 안 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제 아무리 소화를 잘 시켰어도 뽕나무 진액만 모아 오줌까지 싸대니 알싸하고 씁쓸한 냄새가 방안에 진동하고 온몸에 옷에 절었다.
쉬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 집안은 난리가 나는 통에 출입문에는 항상 모기장이 쳐져 있었다. 어쩌다 잘못하여 파리 한 마리 들어와 누에와 같이 놀다보면 몸 속으로 균이 침투해 까맣게 변색이 되어 죽고 만다. 병이 생긴 놈은 가차없이 골라내야 한다. 골라서 닭에게 던져 주면 잘 먹었지만 웬만해서는 그리 하지는 않았다. 병이 한 번 돌았다가는 전체가 까맣게 변해 죽어버려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 불에 태워 죽이는 게 상책이었다.
고치를 잣는 모양을 보고 한 시름 놓았다가는 일을 잡칠 수 있다. 이 때는 병든 놈, 집 짓지 않고 딴 짓 하는 놈을 골라내야 한다. 그래야 1등을 받을 수 있다. 등급별로 따로 추려 나일론 가마니에 넣어 수매 날짜가 오기를 기다린다.
간혹 선택되지 못한 놈이나 밖으로 기어나간 놈 한 두 마리가 방 구석지 어두운 곳에 집을 지어 놓은 경우도 있고 집을 짓지 못한 누에는 며칠 있다가 알을 까기 시작한다. 500~600개나 되는 알을 종이 위에 줄줄이 까놓으니 그 모습 또한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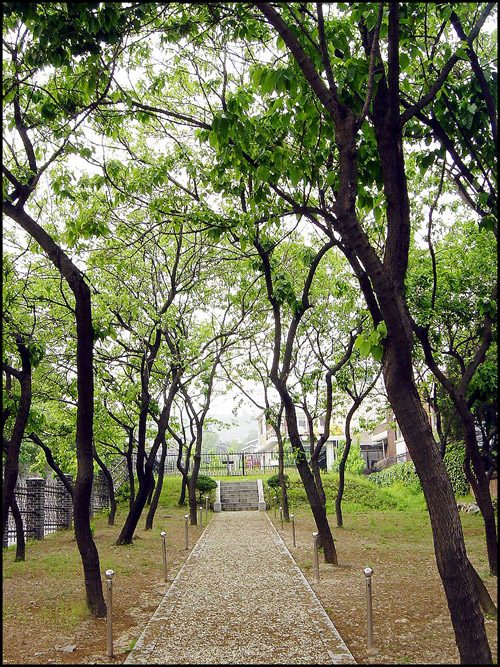
▲선잠단에 있는 10미터가 넘는 뽕나무 ⓒ 김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