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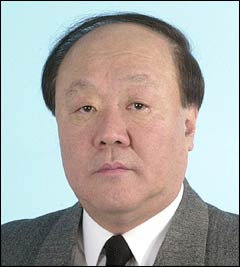 |  | | | ▲ 김대중 이사 기자 | | | ⓒ 조선일보 | 저녁에 집에 오다가 가판대의 조선일보를 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실렸더군요. 당신께서 미국'이사'기자로 발령나서 새로 뛴다는 기사였습니다. "미국에 우리입장 전하는 기사 쓸 것"이란 작은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편지를 드립니다.
제게 낯이 익은 당신의 얼굴은 왼쪽의 60대 중반의 당신 얼굴이 아닙니다. 그보다 15년 전의 얼굴이지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15세 무렵, 당신의 아들인 SW와 전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SW는 반장이었지요. 저보다 10cm는 더 크고, 그 덩치만큼이나 우리보다 어른스러웠던 친구, 전 그 친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도 놀러 갔더랬습니다.
당신의 얼굴도 그 때 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들이 그랬듯이 당신은 아들 친구들에게 '어 SW 친구냐? 놀다 가거라'정도의 말 밖에는 하시지 않았기에 별로 말씀을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요.
비록 고등학교 이후 SW와 헤어지면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몇년전까지도 가끔 SW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지금은 소식이 아예 끊어져버려 안타깝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친구 아버지인 당신께서 조선일보에 쓰시는 기명 칼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한국의 몇째가는 신문에 글을 쓰신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더랬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무렵,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인으로 당신을 뽑았습니다. 역시 제 일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교 들어간 후 얼마 뒤 동생이 보는 논술시험용 명문 모음집에 당신의 칼럼, '오늘도 우리는 거리의 편집자들에게 졌다' 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당시 보도지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신문을 만들 수 없었던 언론인의 처지를 과감하게 고백(고발)했던 칼럼이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른 신문과 확연히 달라지더군요. 한총련에 대해 왜 총을 쏘는 것을 자제하냐는 논설을 보고 대학생이던 전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에서는 나올 수 없는 논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의 김대중 칼럼은 비록 '총을 쓰는 것을 자제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총련 사태에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더군요. 의심할 바 없이 주필이신 당신께서 이러한 강경론을 주창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거리의 편집자에게 진' 민주주의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기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논조의 우경화가 심해 지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어져 갔습니다. 덕분에 당신께서 80년 광주에 가셔서 그곳을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기사에서 광주 사람들을 '폭도'라 지칭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 친구 아버지라는 이유로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선일보 주필이 내 친구 아버지라는 이야기도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는 보지 않아도 전 당신의 칼럼만은 찾아 읽습니다. 읽을수록 절망감만이 강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럴수록 더 찾아 읽습니다. 당신 세대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당신의 칼럼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성실하다면 성실한 것이겠지만 당신의 성실함에는 비할 바가 안될 겁니다. 친구들 중 언론에 몸담은 친구들은 당신을 거의 신화적인 기자로 알더군요. 비록 생각은 다르더라도 기자로써의 성실함에 있어서는 당신을 따를 사람이 없다더군요. 조선일보 기자들의 남다른 성실함도 당신의 자세에 힘입은 바 크다지요. 다시 기자로 현장에 서시겠다는 오늘 기사도 당신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한 일화일 겁니다.
그러나 전 당신께 그만 쉬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섭섭하시겠지만 전 정말로 당신께서 제발 '미국에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기사'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께서 전할 '우리'가 '우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티조선'에 대한 칼럼을 읽어보면 당신은 당신의 반대되는 생각들도 찾아보시는 것 같더군요. 성실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당신께서 어련하시렵니까. 그럼에도 당신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들의 당신과 다른 생각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시지 않는 것 같더군요. 당신이 대표할 '우리' 속에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이후의 당신의 칼럼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칼럼의 내용처럼 젊은 사람들 역시 '당신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세대가 당신의 세대가 아닌 저희, 그리고 당신 아드님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사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함은 거역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께서 처음 기자를 시작할 때 40대 기수론을 외치던 김영삼과 김대중을. 제가 SW와 같은 반에서 뒹굴던 때, 40대의 나이로 한국 유수의 신문에 기명칼럼을 싣던 당신을.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70대의 김영삼과 김대중의 몰락을. 이제 환갑을 넘어서 한국 최고의 언론인에 오른 당신께서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는 기사를 실어 가면서까지 반대해도 대통령에 오른 50대의 노무현을.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21세기가 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었지 노친네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당신께서 그걸 거부하고 70대까지 언론인으로 남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70대의 노망난 김대중'꼴이 되고 말 겁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제가 제 친구인 당신 아드님 이름을 밝힐 수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먼 곳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