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백남준과 제프리 쇼의 작품이 보이는 지하전시장과 1층 매장의 풍경 ⓒ 백종옥
필자는 지난 몇 년간 구제금융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의 몇몇 기업산하의 갤러리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종종 접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갤러리 운영을 중단하는 그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위급한 경영상황에 놓여있는지도 의아했고, 또 갤러리를 개관했을 때 당당히 내걸었을 그 기업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지 그 짧은 경영안목이 그저 씁쓸할 뿐이었다.
물론 코딱지만한 갤러리 하나 폐관해서 그 기업들이 융성한다면 백번을 폐관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만 같은 그런 경박한 대처방식들을 봤을 때 돈많은 기업들은 문화예술사업을 마치 팔찌나 귀걸이 같은 장식품 정도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진취적인 안목이 있는 기업인이라면 기업에서 펼치는 문화예술사업들이 단지 기업의 장식품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이 행하는 지속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사업들은 당장 눈에 띄는 광고효과보다도 오히려 기업이미지를 더욱 깊이 각인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련사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니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선 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련사업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이미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이러한 서설을 늘어놓는 이유는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매체예술전시회 'Navigate@art(전시기간2002.6.27-9.8)'를 소개하고자 함이다. 그저 재미있는 전시회 하나로 보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전시회의 장소가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갤러리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나아가 기업과 예술이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
전시공간의 흥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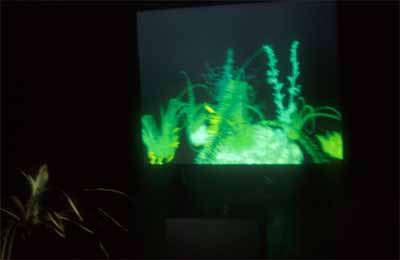
▲2,두 작가의 공동설치작품(The Interactive Plant Growing/1992) ⓒ 백종옥
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공간은 베를린의 중심거리인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에 있는 일명 '아우토모빌 포룸(Automobil Forum)' 이라는 유명한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Volkswagen)`의 지점건물 지하이다.
우선 이 건물 1층을 살펴보면 폴크스바겐 외에도 롤스로이스(Rolls-Royce)나 스코다(Skoda) 등 이름있는 회사들의 멋진 자동차들이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악세사리들과 함께 전시판매되고 있고 폴크스바겐 은행, 레스토랑, 서비스 인터넷카페 등이 개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2층에는 영업사무실, 회의실, 보험서비스, 고객서비스 등 여러가지 사무실들이 자리잡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하층이 바로 전시회나 음악회와 같은 문화행사들이 열리는 공간이다.
건물안으로 들어서면서 눈에 띄는 점은 무엇보다도 1층에 있는 자동차매장들과 지하층의 미술전시공간이 에스칼레이터로 연결되어 있고 1층에서 보면 지하층의 미술작품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점이다. 물론 지하층에서 전시회를 관람할 때는 1층과는 다른 독립적인 느낌을 편안하게 주고 있다. 즉 전시회와 자동차매장들이 갖는 어떤 거리감을 공간에서 부터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있다.
이 '아우토모빌 포룸(Automobil Forum)'이라는 곳은 폴크스바겐을 중심으로 여러 자동차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동시에 문화예술행사들이 열리는 커뮤니케이션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곳 지하층의 전시공간이 기존의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산하의 독립적인 갤러리들과는 달리 자사제품의 이미지에 직간접적으로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들을 기획하고 또한 그 문화예술행사들 속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용해시킬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전시작품들의 흥미로움

▲3,토니 아우어슬러의 '헬로우(Hello?/1996)' ⓒ 백종옥
매체예술전'Navigate@art'는 자사제품의 이미지에 직간접적으로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전시로서 기획되었겠지만 그렇다고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라는 '상품'에 종속된 그렇고 그런 부대행사용 이벤트같은 어줍잖은 전시회는 물론 아니다.
이는 전시된 작품들과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독일 칼스루에(Karlsruhe)시에 있는 '예술과 매체기술센터(ZKM)'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의 출품작들 대부분은 관객과 작품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설치작품(interactive Installation)'들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선구적인 첨단매체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것들이다.
- 그럼 이제 전시장을 둘러보자.
먼저 전시장 중앙에 텔레비젼들을 조립한 백남준의 작품(Passage/1986/사진1)이 성상을 떠받드는 종교적 건축물 처럼 우뚝 서있는 것이 눈에 띈다. 문화와 문화사이의 다리로서 언어의 참된 의미를 텔레비젼을 통해 묻는 이 작품은 주변에 있는 다른 작가들의 보다 최근작들로 인해 고전적인 인상마져 풍긴다.
백남준의 작품 앞으로는 역시 매체예술에 있어서 구세대 분위기가 느껴지는 디터 키슬링(Dieter Kiessling)의 '흔들리는 티브이(Pendelnder Fernseher/1983)'가 관객의 시선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며 메달려 있고 백남준의 작품 뒤에는 두 작가(Christa Sommerer, Laurent Mignonneau)의 매우 흥미로운 공동설치작품(The Interactive Plant Growing/1992/사진2)이 있다.
관객이 어두운 영상 앞에 있는 5개의 실제식물들을 만지면 신기하게도 그 식물들이 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듯 빠르게 자라난다. 그 식물들이 이루어내는 매혹적인 풍경은 무궁무진한 변화가 가능하다.
백남준의 작업 옆으로 제프리 쇼(Jeffrey Show)의 '읽을 수 있는 도시(The Legible City/1988-1991)'가 영상으로 펼쳐저 있는데 그 앞에는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다. 관객은 그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영상에 따라 언어로 건설된 도시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이 제프리 쇼의 맞은 편 벽면에도 역시 도시를 여행하는 미하엘 나이막(Michael Naimark)의 영상작품(The Karlsruhe Moviemap/1991)이 있다. 관객이 여행하는 이 도시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실제 독일의 칼스루에(Karlsruhe)시의 전철운행노선을 따라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서 조종칸에 선 관객은 마치 전철의 운전수처럼 여러 노선을 마음대로 다니며 도시의 풍경을 속도감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그 옆으로 쉐인 쿠퍼(Shane Cooper)가 설치한 작품(Parasight/2001)은 카메라 앞을 지나가거나 혹은 여러가지 제스츄어를 취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다가 또 이미 지나간 다른 관객들의 모습을 회상하듯 보여주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곳을 통과하면 약간은 불쾌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궤짝 속의 한 얼굴을 만나게 된다. 토니 아우어슬러(Tony Oursler)의 '헬로우(Hello?/1996/사진3)'라는 이 작품은 궤짝 속의 인형에 영사기가 얼굴을 투사하고 있는데 이 얼굴은 혼자 무언가를 계속 지껄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약간은 머슥해하거나 떫떠름한 표정을 짓고 돌아선다.
여기서 돌아서면 전시장 가운데 어두운 방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 안에는 책상과 전등이 있고 창문도 보인다. 책상 위에는 영상으로 비춰지는 가상의 책 한 권이 놓여 있는데 호기심 가득한 관객이 펜으로 움직일 때마다 책장이 넘겨지거나 책 속의 그림들이 변하고 방구석에 있는 가상의 문이 열리면서 조그만 아이가 들어왔다 나가기도 한다. 책 속의 언어들이 일본어라는 점으로 이 작품(Beyond Pages/1995)의 작가가 일본인(Masaki Fujihata)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방을 돌아나오면 이번엔 한 여자의 얼굴 정면(Alba d'Urbana 작가자신)이 화면에 보이는 작품 '터치 미(Touch me/1995)' 앞에 이른다. 말 그대로 관객들은 이 여자의 얼굴 여기저기를 손으로 만지고 문지르는데 어느덧 그녀의 눈코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관객의 눈코입이 반사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제 전시장을 돌아 처음의 그 자리로 다시 오면 마지막으로 볼프강 뮌흐(Wolfgang Muench)와 키요시 후루카와(Kiyosh Furukawa)가 공동작업한 날아다니는 '공기방울들(Bubbles/2001/사진4)'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공기방울들은 관객의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림자가 공기방울을 건드리면 튕겨나가거나 터져버린다.
관객들은 처음엔 이 기술의 신기함에 놀라워 하다가 이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시절 비누방울을 만들어 날리던 것처럼 장난을 하며 즐거워한다.
기업과 미술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4,뮌흐와 후루카와의 공동작품 '공기방울들(Bubbles/2001)' ⓒ 백종옥
예술과 기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하고 그 간극이 얼마만큼 좁아졌는지를 실감나게 해주는 이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출품작가들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미술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에니메이션을 비롯한 첨단매체와 정보기술들을 두루 공부했고 더우기 어떤 작가들은 자신들이 섭렵한 음악, 철학, 식물학과 생물학까지 작품에 드러내는 걸 보면서 첨단매체예술은 바야흐로 모든 기술과 학문들이 융합되는 종합예술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역시 필자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그저 유명한 갤러리나 박물관에서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은 전시기획자의 생각과 또 이러한 수준있는 기획들을 대기업의 지점이 문화예술행사를 함께 하는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센터라는 형태로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즉 돈을 주무르는 기업이 이러한 '문화예술적 마인드'를 가지고 작가들의 활동을 후원함과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기업과 미술이 보다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선 독일처럼 작가들의 활동을 후원하고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감면혜택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제품과 경제활동을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어떤 문화적 코드 속에 용해시키고자하는 비젼이 준비되어 있어야할 것이다.
전시회를 보고 나오면서 필자의 눈길은 건물로 들어올 때는 눈여겨 보지 않았던 1층의 자동차들로 갔다. 눈길은 출입구 옆에 전시된 정말 '예술'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 없는 멋진 디자인의 첨단자동차에서 멈추었다. 순간 지하층의 '첨단예술작품'과 너무나 '예술적인 첨단제품'과의 경계가 흐려짐을 느꼈다.
이게 바로 이 전시회의 숨은 의도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