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2월 22일 밤 11시.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리에 앉는 순간. 약간 어지러운 것도 같고 몸뚱이가 뱅글뱅글 도는 것도 같은 아리송한 어지럼증을 잠깐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 알딸딸한 느낌은 취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냄새도 못 맡는 소주를 분위기에 취하고 그 분위기를 달구던 사람들에게 취해 겁 없이 서너 잔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밤과 한참 눈맞춤을 했습니다. 태양의 자리를 차고 앉은 어둠 위로 화려한 네온사인이 칭칭 휘감겨 있었습니다. 해만 지면 온통 암흑천지가 되는 시골마을만 보아오다 깊을 대로 깊은 밤이 한낮보다 오히려 더 밝은 서울거리는 말 그대로 별천지였습니다. 한참을 서울의 밤 구경에 넋을 놓았습니다.
화려한 불야성을 빠져 나온 버스가 서울언저리의 어둠 속을 달릴 때쯤. 문득 손끝으로 느껴지는 기분 좋은 말랑거림에 시루떡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모님들 좋아하실 거라며 기어이 한 봉지 더 손에 들려주시던 동료기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배려가 그때서야 훈훈한 말랑거림이 된 탓인지 버스 창에 비치는 제 얼굴엔 실성한 사람마냥 연신 헤실헤실한 웃음이 번져 나고 있었습니다.
2006년 2월22일 저녁.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누군가 절더러 실성한 사람 같다 했을지라도 애써 무시했을 겁니다.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비실비실 배어 나오는 웃음을 절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과분한 것임에도 제 가슴에 안겨진 상패가 좋았습니다. 더불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뼈 속까지 일깨워준 <오마이뉴스>가 곁에 있어 행복했고,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고 또 당당하기 위하여 다시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이 또한 기꺼웠습니다.
따지고 보니 <오마이뉴스>와 인연을 맺은 시간이 채 일 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꽤 오랜 세월 <오마이뉴스>와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아마도 그 짧은 세월이 제 인생에 가져다준 어마어마한 변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5년 3월 18일 이전. 제 삶은 한 마디로 무료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제 하루하루는 그저 덤덤했습니다. 날 밝으면 남편은 일터로 향하고 아이는 무탈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날이 그날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는 감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일까. 내가 안주하고 있는 내 일상이 정녕 전부일까. 내가 살아가고자 열망했던 삶이 바로 이 모습일까.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만 보내기엔 내 삶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 즈음. 알 수 없는 헛헛함이 제 일상에 옹이로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덤덤한 하루하루가 짙은 먹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늘 어두컴컴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 부을 듯한 비바람에 오돌오돌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커먼 하늘 사이로 고개 내민 한줄기 햇살을 보았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햇살너머엔 다른 세상이 있을 듯했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세상 구경 한 번 해보고 싶은 제 불같은 욕심에 <오마이뉴스>는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한 달여. 눈만 뜨면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들 구구절절하게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습이야 다들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들에겐 다른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 저는 <오마이뉴스> 사는이야기에 글을 쓰는 많은 시민기자들로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분이라도 그들에게 무심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기쁜 순간은 행복해 하고, 슬픈 순간은 참아내고자 의지를 다독이고, 괴로운 순간은 이 악물고 견뎌내야 한다는 약속을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되짚을 줄 알았습니다.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 즉, 삶의 철학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나태함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던 저와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저란 사람도 제 일상을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 작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되었습니다. 제 일상을 향하여 깊이 던져진 시선은 온 사방에서 일제히 고개를 쳐든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썼습니다. 눈이 느끼는 건 본 대로 쓰고 코가 느끼는 건 냄새를 맡는 대로 썼습니다. 생나무가 무엇인지 잉걸이 무엇인지 그런 것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 무심했던 순간순간을 다시금 되짚어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1년도 안 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생활 동안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저 덤덤했던 저의 하루하루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 또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는 아이, 보고 싶을 땐 언제라도 볼 수 있는 부모님들. 제 삶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랬기에 제 하루하루는 늘 덤덤했고 평범했습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행복이란 걸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면서부터 뼈 속 깊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오늘 같은 내일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지금 이 순간 가슴에 뜨겁게 사무칩니다.
 | | | ▲ 2월22일상 상패 | | | ⓒ 김정혜 | |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일깨워 준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건만 <오마이뉴스>와 함께 하는 동안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에 받은 '2월22일상'이고, 두 번째가 <오마이뉴스>에 쓴 글을 모아 출간한 '시골아지매의 행복한 수다'라는 한 권의 수필집이며, 세 번째가 제 나이 마흔 셋에 대학신입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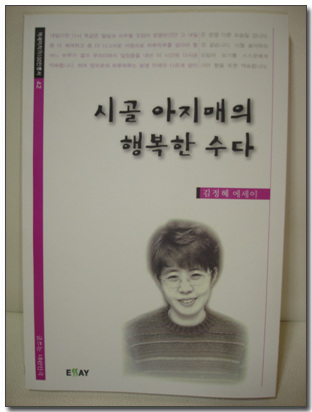 | | | ▲ 생애 첫 출간이라는 기쁨을 안겨 준 <시골아지매의 행복한 수다> | | | ⓒ 김정혜 | | 무식하면 때로 용감해진다고,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그때를 돌이켜 보자면 저란 사람이 참 용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저 쓰고 싶은 대로 썼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여 2월22일상 수상도, 출간한 수필집도 제겐 크나큰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용감하고 싶습니다.
 | | | ▲ 내 인생의 또 다른 출발. 방송통신대학 교과서 | | | ⓒ 김정혜 | | 하여 뒤늦게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아니, 이제부터는 당당한 글쟁이로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큰 꿈을 안고 3월 4일 입학식에 저는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고백하자면, 사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앞서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오매불망 <오마이뉴스>를 향해 쏟아 부었던 그 불같은 열정이 늘 저를 달구어주길 빌 따름입니다.
"아줌마. 종점 다 와가는 데 어디서 내리실 거예요?"
기사아저씨의 물음에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새 버스는 마을 입구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버스가 우리 마을까지 달렸을 1시간 30분 동안 지난 제 11개월의 시간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가슴에 상패와 시루떡을 꼭 끌어안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패와 시루떡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준 남편. 그가 있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의 11개월이 그토록 화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듯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줄 우리 남편.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주잡은 남편의 손이 참 따스했습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