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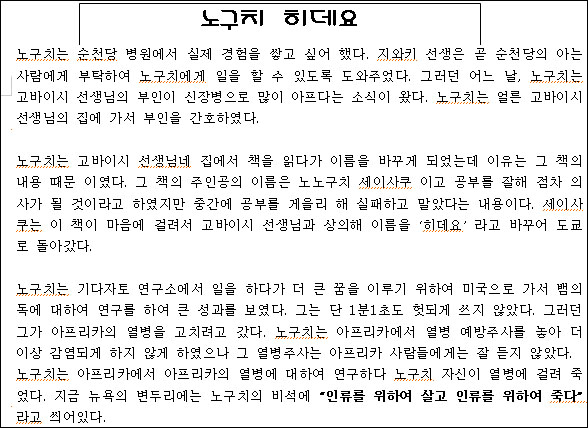
▲'노구치 히데요' 독후감중 후반부 ⓒ 박명순
"이거, 진짜 네가 쓴 거 맞아?"
개학을 코앞에 둔 초등생 아들놈이 써놓은 독후감을 한참 읽어보던 남편이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의 표정을 살피던 남편은 끝내 자신이 썼다고 우기는(?) 아들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연필을 가져와 의심나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말했다.
@BRI@"아니, 네가 어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단 말이지? '촉박한'의 뜻이 뭐지? 여기 '국민학교'란 이 말, 네가 '국민학교'란 단어를 어떻게 알아? 너,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한 거 맞지?"
독후감은 물론 숙제조차 인터넷에 뜬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복사해 가는 게 요즘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엊그제 일주일 동안 20권의 책을 읽어댄 아이의 책 줄거리 이야기를 끈기있게 들어주고 또 만족해 하던 남편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아이의 독후감은 내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했다.
믿으려 들지 않고 무작정 죄인 다루듯 하는 제 아빠가 원망스러운 듯, 아이는 몇 마디 대꾸하다 말고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멀찌감치 앉아 지켜보던 내 마음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설령, 아이가 '거짓'을 말한다 해도 적어도 '핑계'를 댈 시간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해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허리를 자르며, 자신의 '편견'대로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이 몹시 못마땅했다. 그렇다고 아이 훈계하는데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마음만 쪼그라들고 불안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남편은 끝내, 종이를 한쪽으로 던지듯 밀어 놓으며 일갈했다.
"끝까지 네가 썼다 이 말이지?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독후감 한 편 더 써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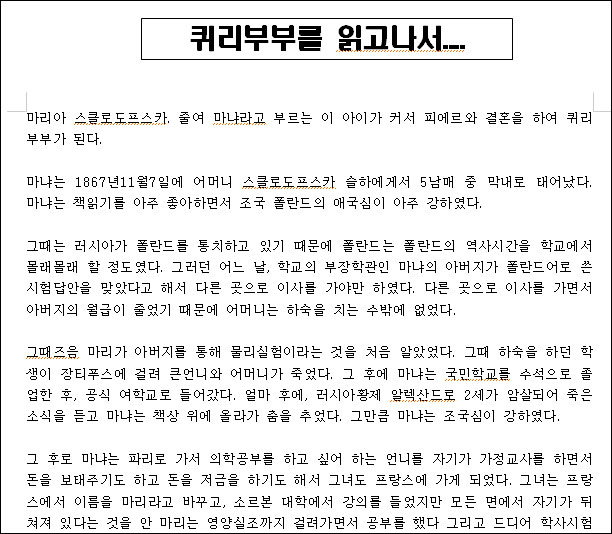
▲'퀴리부부' 독후감중 초반부 ⓒ 박명순
쓰는 것보다 타자치는 것이 더 익숙한 아이는 왼손잡이다. '타다닥' 양손 검지로 글쇠를 치면서 30여분을 앉아 있나 했더니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 든 내용들을 화면 안에 쏟아놓았다. 프린트 해 가져온 것을 받아 읽던 남편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풀과 돌, 새와 바람 그리고 대지 위의 모든 것들처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장루슬로는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늙어가듯, 아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금씩 성장하고 생각의 깊이도 더해지고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이다. 늘 제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조바심이 아이를 닦달하고 다그치고 의심케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출근하려고 현관을 나서는 남편을 따라 나섰다. 간밤의 서운함을 털어내지 못한 내가 기어코 한 마디 했다.
"거봐. 왜 무작정 의심부터 하고 그래? 걔가 얼마나 상처 입었겠어. 설령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정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부모 역할이지, 무슨 형사도 아니고."
"햐, 그 놈, 천재 아냐? 변해도 너무 빠르게 변해가네."
머쓱한 남편이 씨익 웃으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다. 지나친 칭찬은 자만을 부르므로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칭찬 한 마디에도 고뇌가 깃들 일이거늘, 섣부른 의심은 절대 삼갈 일이다. 아이가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어찌 다독거려 주나. 때마침 잠이 덜 깬 아이가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다.
"아빠는 네가 혹시 자만해 할까봐 그러신 거야. 그리고 이건 엄마 생각인데, 만약 엄마라면, 기분 나쁘다가도 오히려 기쁘기도 할 것 같은데? 어? 내가 아빠가 의심할 정도로 글을 잘 쓴다는 얘기지? 하고 말야."
그렇게 얼버무리면서도, 아이를 믿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해서 아이의 등짝을 자꾸만 쓸어내렸다.
덧붙이는 글 | 저의 첨삭을 싫어할 정도로 아이는 무척 자존심 강한 편입니다. 제 마음은 물론, 표현이 맞지 않거나 어설픈 문장들은 고쳐주고 싶은 욕심이 앞서지요. 그러나 그것조차 스스로 고쳐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독후감이나 일기를 억지로 쓰게 하지 않습니다. 독후감이나 일기를 별로 쓴 일이 없는 이런 아이도 한 해 한 해 다르게 커가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소중한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