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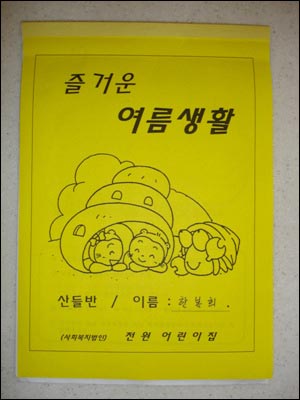 |  | | | | | | ⓒ 김정혜 | 다음주 금요일(29일). 남동생을 시작으로 우리집은 여름 휴가를 온 손님들로 아마 북새통을 이룰 것이다.
유치원 방학도 방학인지라 방학 숙제가 제법 푸짐했다. 하여 일찌감치 방학 숙제를 마칠 양으로 그래도 덜 더운 오전이 낫다 싶어 일찌감치 아이를 책상에 앉혔다.
학창 시절 길고 긴 방학 동안 주야장천 놀다가 겨우 이삼 일 만에 벼락치기 방학 숙제를 했다. 그런 내 지난 날의 잘못된 습관이 내 아이에게만은 길들여지지 않게 하려는 엄마의 반성도 아이를 일찌감치 책상에 앉히는 데 한데 한몫 했다.
먼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아이의 요구에 따라 여름방학 계획서를 짰다. 동그란 시계 모양을 한 여름방학 계획서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에 잠시 웃음이 나왔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  | | | | | | ⓒ 김정혜 | 다음은 문제집 차례였다. 아이에게 스스로 하도록 일러 주었다. 다만 모르는 것은 물어 보라고 했다. 문제를 읽는 아이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했다.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술술 문제를 풀어 나갔다. 문제를 이해한다는 뜻이었다.
아이를 앞에 앉히고 가, 나, 다, 라 글자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건만 단 한 번도 더듬거리지 않고 막힘 없이 시원하게 읽어 나가는 게 참 신통방통했다.
한 장을 다 푼 아이가 맞나 틀렸나를 봐 달라며 문제집을 내밀었다. 틀린 게 없었다. 아이의 머리를 곱게 쓰다듬어 주며 참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칭찬 탓일까. 한 장을 더 풀겠단다.
문제를 다 읽은 아이가 한참을 문제집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복희야! 왜?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예."
"어디 보자."
 |  | | | | | | ⓒ 김정혜 | 먼저 푼 문제는 한글을 깨우치는 문제였고 이번 문제는 더하기 빼기에 관한 문제였다. 딸아이는 수에 약했다. 지난번 올케가 보내준 문제집을 딸아이와 함께 풀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그 문제들이 내 경험상으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접했던 것 같았다. 해서 어쩌면 일곱 살 아이로선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랬기에 수에 약하다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기도 하다.
"복희야! 이건 더하기라는 거야. 봐. 두 개에다 두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되는 걸까?"
"음… 네 개요."
"그럼 세 개에다 몇 개를 더하면 일곱 개가 되는 걸까?"
"음… 음…."
아이는 연신 손가락을 폈다 구부렸다 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아이는 2 더하기 2는 쉽게 4라는 답을 찾아내는데, 4라는 답을 미리 내놓고 2에다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았다.
"복희야! 냉장고에 사과가 3개밖에 없었는데 복희가 유치원 갔다 와서 냉장고를 열어 보니까 사과가 일곱 개가 있었어. 그럼 엄마가 복희 유치원 간 사이 사과를 몇 개 더 사다 놨을까?"
"음… 음…."
"복희야! 그럼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해봐. 자! 왼손으로 하나, 둘, 셋. 셋까지 세었지. 일곱 개까지 세려면 몇 개를 더 세어야 하지."
음… 음…."
 |  | | | | | | ⓒ 김정혜 | 속이 탔다. 급한 성격에 목소리가 커지려 하고 있었다. 다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몇 번이나 더 설명을 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껌을 인용해 보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인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아이의 입에선 내가 바라는 똑 떨어진 답이 냉큼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인내심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찬물에 세수라도 해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할 것 같았다. 아이에게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던져 놓고 욕실로 들어갔다.
'아이가 정말 수에 대해 약한 것일까.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그저 맘껏 뛰어 놀라고 한 게 잘못된 것일까.'
이런 저런 생각에 한참을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복잡한 갈등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욕실에서 나온 건 한참 후였다. 그런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찾아 밖으로 나갔다. 친정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 숫자공부 하기 싫어요."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숫자공부를 하기 싫다며 엄마가 자신에게 숫자공부 시키지 않게 해달라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래. 지금 하기 싫으면 좀 놀다가 나중에 해. 그건 방학숙제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놀다가 나중에 엄마랑 다시 해봐. 알았지?"
하지만 아이는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도 집에 오지 않았고, 밖이 캄캄해졌는데도 집에 오지 않았다. 거의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서면서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시계 그릴 때 9시에 잔다고 그렸잖아요. 이제 9시 다 되가니까 자야 해요. 엄마가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시에 자는 건 자신 있는데 숫자공부 하는 건 자신이 없어요."
"복희야! 숫자공부는 처음엔 누구나 다 어려운 거야. 옛날에 엄마도 그랬어. 하지만 자꾸 해보니까 나중엔 엄청 쉬웠어. 그러니까 복희도 내일 다시 엄마하고 한 번 더 해보자, 알았지? 자, 약속!"
아이는 작고 귀여운 새끼손가락을 걸더니 엄지손가락으로 도장까지 꾹 눌러 찍었다. 그리곤 어느새 곤한 잠에 빠져 들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아이도 공부라는 육중한 틀 속으로 한 발 한 발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안가 그 틀 속에 갇혀 버리고 답답함과 고단함으로 숨을 헐떡일 것 같다.
지금으로선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그저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내 이 생각이 유효할지…. 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 밤엔 전혀 시원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