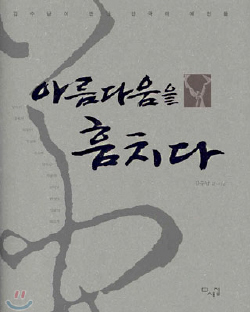
▲아름다움을 훔치다 ⓒ 디새집
약 한 번 못 써보고 저승으로 보낸 아들, 살아 생전 쇠고기국은 몰라도 하다 못해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먹이지 못했다. 명절이라고 색동옷 한 벌 입혀보지도 못했다. 남편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했던가. 방금이라도 "어무이"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엄마 없이 가는 저승길이 두려워 제 집 마당을 기웃거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제 죽은 것도 모르고 마당의 감나무를 살살 흔들어 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제 놀던 고샅길에서 깡총거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오느니 눈물이요, 지느니 한숨이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다. 죽은 자는 죽은 자, 산 자는 산 자. 올망졸망 살아 있는 자식들 입에 거미줄을 칠 수도 없는 일, 천근만근 몸을 일으켜 세워, 어찌했든 힘을 내서 살아 봐야겠다. 이왕지사 지나간 일 가슴 깊숙이 슬픔을 묻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겠다.
잊는다고 해서 잊을 일이면 천만번을 잊었으리라. 가슴에 묻은 피붙이를 어찌 잊겠는가. 두고두고 눈물이요 비죽비죽 한숨이다. 새벽꿈에 울며 보채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안되겠다. 눈물이야 한숨이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장리쌀이라도 빌어 떡도 좀 하고 과일도 사고 북어도 한 쾌 마련해야겠다. 죽은 아들을 불러 배불리 먹이고, 주인 없는 배고픈 귀신들도 불러다가 잔치를 좀 벌여야겠다.
굿판이 벌어진다. '그 녀석 살아서 고생만 하더니…….'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이 모인다. 이제 판을 시작할 때, 분노인지 한인지 모를 가슴 속의 상처들을 불러다 장구를 치고 징을 쳐 한바탕 흐드러진 춤판이다. 바야흐로 슬픔과 상처의 아수라장이다. 무당의 깊고 어두운 노래가 가슴을 파고든다. 켜켜이 쌓인 가슴 속의 괴로움이 일어선다. 눈물과 한숨이 비어져 나온다. 말로 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밀려온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비어져 나온다. 슬픔과 응어리의 절정에서 갑작스레 무당은 죽은 아들이 된다. 이른바 접신(接神)이다. 죽은 아들이 무당의 몸을 빌어 산 자의 땅으로 온 것이다. 왔구나. 왔어. 쇠똥이가 왔구나. 개똥이가 왔구나. 어머니는 와락 무당을 껴안는다.
어머니는 무당을 껴안고 흐느낀다. 이 놈아, 네가 왔구나, 살아서 고생만 하더니 네가 죽어서 이렇게 왔구나. 아버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한숨만 쉰다. 무당은 흐느끼며 말한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왔어요. 무당의 눈에서도 연신 눈물이 솟는다. 산 자와 죽은 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살아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산 자는 가슴의 한을 씻어 버린다. 죽은 자는 무당의 손을 빌어 산 자와 화해한다. 슬픔은 슬픔의 표정을 쉽게 알아보는 법, 누구랄 것도 없이 구경꾼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그들 또한 상처를 가슴 깊이 묻고 사는 자들이 아니었던가.
이제 죽은 자를 보낼 때다. 무당은 말한다. 어머니, 어머니 이제 잘 사세요. 그래 잘 가라. 미안하다. 이승 걱정은 말고 이제 잘 가라.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민다. 망자는 떠나가고 산 자는 끝까지 살아서 몇 방울의 눈물을 더 흘려야 한다. 어찌했든 죽은 아들을 저승으로 보내고 나니 속은 후련타. 가슴 속의 한이야 모두 삭아 내리겠는가마는 마음과 몸은 한결 가볍다. 세상 견디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랴. 묵은 체증이 가라앉은 듯 조금은 살 것 같다.
굿을 안 좋게 보는 이들이 많다. 나 역시 그랬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던 할머니는 해수병으로 생을 일찍 마감해야 해야 했던 남편과 스물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두 아들의 혼령을 위해서 숱하게 굿을 하셨다. 어린 내 눈에는 그것이 마귀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굿하는 광경 또한 굿에 대한 혐오감을 부채질하는 데 한몫을 했다. 어떤 괴기스러운 기운에 휩싸여 울고 웃고 하는 이들이 반미치광이로 보이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샤머니즘은 청산해야 할 인습이라고 가르쳤다. 교문에는 '과학입국'이라는 푯말이 내 걸리기도 했었다. 이성의 공화국에서 샤머니즘은 얼씬도 할 수 없었다.
과거에는 굿판이 많았다. 치병을 목적으로 하는 병굿, 집안의 경사를 조상에 알리는 여탐굿, 죽은 자와 산 자의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씻김굿,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굿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 어디에서도 굿판의 징 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2004년 10월에 인천에서 제1회 세계샤머니즘축제가 열린단다. 이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김금화란다. 김금화라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김금화는 유명세만큼의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지는 못했다. 오늘날 무속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무형문화제로 지정해 준 덕에 國巫(나라무당)로 대접까지 받는 김금화. 그녀는 외국에도 수없이 초대 받아 현장 굿을 펼치기도 했다. 1985년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된 김씨는 이 행사에서 우리의 전통 굿 문화를 세계에 알릴 생각이다.
"굿장단의 살풀이춤을 보세요. 음악과 창, 무용 등 모든 전통예술이 굿에서 나왔지요."
그녀는 이번 행사에서 전통 원형에 충실한 내림굿을 보여줄 작정이란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일지는 의문이다.
굿 마당에서 김금화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녀를 진정한 예인으로 대접해 온 사진꾼이 있다. 바로 김수남. 굿이 야만으로 취급되던 시절, 그는 신문사의 일을 하면서도 굿을 한다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나섰다. 택시가 한대밖에 없는 섬에서는 경운기를 타고 진흙길을 달렸다. 그는 카메라의 렌즈를 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열었다. 사람은 단순한 피사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을까. 그는 촌부들과 탁주 한잔을 마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결코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다. 그는 피사체와 같이 마셨고 피사체와 같이 취했고 피사체와 같이 울었다. 그의 사진에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은 없다. 그는 피사체와 교감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무당이었다.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대와 연세대에서 30년 이상의 교직자로 봉직하였고, 오랫동안 김수남과 함께 굿판을 함께 돌아다녔던 김인희 교수는 김수남의 사진이 왜 아름다운가를 말한다.
"김수남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눈을 지닌 큰무당이다. 단지 방울과 부채 대신에 사진기를 들고, 공수를 내리는 대신에 셔터를 눌러 자기가 본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 보통 무당과 다를 뿐이다."
김수남은 한국의 굿 사진으로 이미 20여권의 사진집을 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아시아의 오지를 돌며 그 나라 고유의 민속굿을 렌즈에 담아 다. 그런 김수남이 책을 냈다. <아름다움을 훔치다>(디새집).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틋함'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란다. 심방(제주도의 무당) 안사인, 곱사춤 공옥진, 광대 이동한, 만신 김금화, 명창 김소희, 도살풀이 김숙자 등, 한 때는 천하다고 멸시 던 예인들의 사진에 곁들여 붙인 10인의 한평생과 추억담은 김수남의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기록이요, 망자를 부르는 초혼의 기록이다.
김수남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가 굿판의 슬픈 사연에 매번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저 심방은 굿은 안 하고 울기만 하느냐" 했다는 에피소드도 책은 전하고 있다. 김수남은 "원래 눈물이 많은 터라 슬픈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절로 눈물이 펑펑 쏟아져 주체할 수 없던 나는, 이 눈물 덕도 많이 봤다"라고 고백한다. 눈물은 너의 슬픔에 나의 감정이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가 수많은 예인들의 아름다움을 훔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피사체와 동화할 수 있는 눈물의 덕이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