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17년 전 여름, 중복이 지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서까래에 달랑 슬레이트를 얹은 집이라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이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내렸습니다.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하여 배가 남산만한 채 선풍기 바람이 싫다고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기 잡는 투망을 땅바닥에 펴놓고 뚫어진 구멍을 나이론 실로 깁고 있었습니다.
 | | | ▲ 햇봄, 소가 짚을 씹고 있다. | | | ⓒ 느릿느릿 박철 | | 한가로운 한낮, 매미는 제철을 만났다는 듯이 악을 쓰며 ‘쓰르럭 쓰르럭’ 울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시원한 팥빙수나 얼음을 띄운 열무김치 냉면을 한 사발 먹으면 더위가 좀 가실 텐데 전혀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사택에서 1백여 미터 떨어져 살고 계시는 안장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매우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전도사님요, 큰일 났어요. 우리집 소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권사님, 엊그제 송아지를 낳고 좋아하시더니 그게 무슨 소리래요? 어미 소가 어디 아파요?"
"어미 소가 새끼를 낳은 게 하도 기특하기도 하고, 송아지를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서 내가 가마솥에 보리밥을 지어 미역국에 말아 주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는지… 체한 것 같은데 숨도 못 쉬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수의사를 불러야지요."
"읍내에서 수의사가 아침부터 와서 주사를 놓고 배를 문질러 주어도 소용없어요."
아내와 나는 다급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권사님보다 더 잰 걸음으로 안 권사님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권사님의 아들 진해씨가 외양간에 들어가 어미 소 배를 손으로 문질러 주고 있었습니다. 소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따금 트림을 하듯 ‘푸후~’하고 간신히 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는 이 집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저기 조각조각 널려 있는 밭 뙤기 1천여 평과 소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암소인데도 길을 잘 들여 밭을 잘 갈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안 권사님 집에서는 자식만큼 귀한 소였습니다. 안 권사님이 어디 외출을 했다 돌아와서도 당신은 식사를 하지 못해 몹시 허기질 텐데 논둑에 가서 꼴을 베다 먼저 소를 먹이고 진지를 잡수실 정도로 소를 끔찍이 아끼셨습니다.
 |  | | | ▲ 정선 숙암에서. 안장순 권사님과 함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다. | | | ⓒ 느릿느릿 박철 | 그런 소가 송아지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안 권사님이 가마솥에 보리쌀을 안쳐 보리밥을 지어 미역국에 말아 주었는데 어미 소가 매일 거친 음식만 먹다가 부드러운 보리밥을 먹게 되었으니 탈이 날 수밖에요.
보리밥이 내장 융털돌기에 붙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소가 죽어가는 마당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수의사가 와서 손을 써보았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외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뿔을 잡고 거의 울다시피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 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송아지를 낳고 보리밥을 먹은 것이 체하여 숨도 쉬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살려 주옵소서. 송아지를 보아서, 그리고 안 권사님을 보아서 제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그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그렇게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분 땀을 쏟으며 기도를 한 후 외양간에 나왔는데 소는 여전히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권사님은 여전히 “아이구, 우리 소 죽네, 아이구 어쩌면 좋누?” 아들 진해씨는 “그러게 내가 뭐래요. 엄마가 미련스럽게 보리밥을 많이 주더라니.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고 그만 주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더니…” 자기 어머니께 화를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한참 소를 살피다 다른 방법은 없고 거기 서 있기도 그렇고 아내와 나는 슬며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소가 죽는 것 보다 더 큰 걱정은 안 권사님이 소가 죽으면 얼마나 낙심을 할 것인가? 그것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평소 안 권사님이 소에게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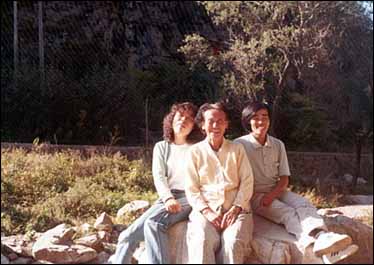 | | | ▲ 왼쪽부터 아내와 안장순 권사님. 그리고 김진해 씨. | | | ⓒ 느릿느릿 박철 | 그날 저녁 TV 9시 뉴스를 건성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안 권사님의 아들 진해씨가 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요. 나와 보시래요.”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컹 주저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필경 ‘소가 죽어서 찾아온 것이 아닌가?’ 내심 불안한 생각을 하며 미닫이문을 열었더니
“전도사님요. 우리가 소가 살아났대요. 이제 숨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송아지가 젖도 먹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내와 나는 한밤중 안 권사님 집을 향했습니다. ‘소가 다시 살아났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 외양간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 권사님이 외양간에서 나를 보더니 달려와 내 손을 덥석 잡습니다.
"전도사님요. 고맙대요. 우리 소가 살아났대요. 전도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 소가 살아났대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네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허허 웃으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여린 아내는 소리를 내며 울더군요. 하느님이 풋내기 전도사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인지, 소가 체한 것이 저절로 뚫려 살아난 것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죽어가던 소가 다시 살아난 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고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기쁨이라고 할까요? 아, 그 시절이 그립고, 안장순 권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