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은 높아진 반면에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 지사(志士)에 가까웠던 언론인들도 점점 '시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일반인들에겐 세상을 만나는 도구와 다름없는 언론.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자. 기자들이 말하는 '기자들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자.
집념어린 기자들의 노력 느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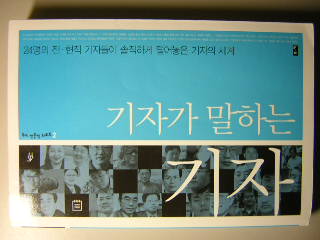 |  | | | | | | ⓒ 김상욱 | <기자가 말하는 기자>(임영주 외 지음, 부키)에는 신문, 방송은 물론이고 통신, 편집, 교열, 인터넷, 심지어는 지방지 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스물네명 전현직 기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기자세계가 보통 생각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치열하고 각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그들은 단순히 마감시간에 쫓겨 기사를 써내는 기계가 아니었다.
졸병 기자의 세상보기, 각 분야별 소개, 각 부서별 소개, 특종의 순간, 기자를 보는 시선, 기자 정보, 미래의 기자 등으로 꾸며져 있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바로 '특종의 순간'이다. 광주민중항쟁, 노근리 양민 학살, 노태우 비자금 은닉 부동산 찾기 취재기를 보면서 집념어린 기자들의 노력이 느껴졌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깊이있게 다가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노근리의 다리'를 특종 보도한 AP통신 최상훈 기자의 노력은 정말 끈질겼다. 자칫 역사속에 묻힐 뻔했던 일을 끄집어내 억울하게 죽어간 망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태평양을 넘나드는 치열한 노력이 바로 진정한 기자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범생이는 필요없다?
기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잠시 잊고, 여기서는 직업으로의 '기자'를 말한다) 영어와 논술, 시사상식 공부에만 몰두하기 전에 한번쯤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기자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에서 박카스 두병과 크림빵 한개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수습시절의 애환을 읽다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 지경이다.
한국언론재단 연수팀 천세익 차장의 '더 이상 범생이는 필요 없다'는 충고는 눈여겨 봐야 한다.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고시제도('언론고시'라는 말이 일반화되다보니 정말 고시를 보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의 한계를 언론사 관계자들도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 채용제도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대목이다.
냉정한 분석, 그러나 우호적인 시선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쓴 '특권의식을 버려라'는 기자들이 가져왔던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지라고 주문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인터넷언론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있다. 그러나 다른 기자들이 쓴 글보다 유독 오마이뉴스 홍보에 치우친 듯한 아쉬움도 든다.
전현직 기자들이 썼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했으면서도 우호적인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필자 대부분이 신문기자 중심인 것도 아쉽다. 사진, 북한, 종교담당, 외신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한 부서의 기자에 대한 소개가 없는 점도 아쉽다.
치열한 경쟁과 긴장,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술과 담배. 기자세계의 내면을 바라보면 힘들어보이는 일 투성이지만 그래도 기자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라면 꼭 읽어 볼 필요가 있겠다. '호랑이와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소와 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의 호시우행(虎視牛行)하는 기자들이 많이 나와 우리 사회를 항상 밝게 비춰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
기자가 말하는 기자
박대호 외 지음, 부키(2003)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