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더러운 더블린. 아일랜드 출신 제임스 조이스가 고향을 표현한 말이다. 아일랜드는 1845년부터 1849년까지 감자 대기근으로 아사자 수가 150만 명에 달했고, 백 년 동안 미국, 호주 이민 등이 겹쳐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1921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오랜 식민 생활의 타성에 젖어 '유럽의 지진아'로 불렸다. 국수적 보호주의와 사기업 국영화, 저성장 고실업 등 골칫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1987년 기점으로 적극적인 개방으로 외국자본 법인세율을 10%로 낮추고(당시 유럽연합 국가 평균은 30%), 고용주, 노조, 농민 등의 사회협약을 시도해 고성장을 거듭했다. 급기야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영국을 따라잡으며 '켈트의 호랑이'로 탈바꿈했고 현재는 유럽의 대표적 발전 모델로 자리잡았다.
반면 아일랜드가 '지진아'였던 시절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능가하는 국민소득 6위의 경제대국이었다. 신의 축복 팜파스 평원의 농축산물은 세계 전역으로 수출됐다. 그러나 잦은 군부 쿠데타와 1943년 집권한 페론의 포퓰리즘으로 아르헨티나는 쇄락의 길을 걸었다.
페론은 자신의 이름을 딴 페론당을 만들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줬고, 연 25%씩 임금을 올려줬다. 의도적 경제민족주의로 외국자본을 차별했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했다. 방만한 재정으로 통화가 증발됐고,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국가 위험도 1위, 20%에 가까운 실업률, 외채 1500억 달러의 '지진아'가 돼버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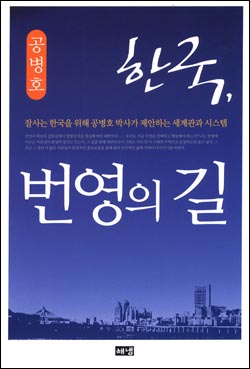 | | | | | | ⓒ 해냄 | <한국, 번영의 길>에서 글쓴이 공병호는 말한다. 지난 책 10년 시리즈에서도 꾸준히 주장해왔던 대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라고 말이다. 하나는 번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쇄락의 길이다. 당연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따라 시장의 효율을 살리는 것이다. 두 나라의 사례를 보듯, 국가가 나서 시장에 개입해봐야 얻을 수 있는 건 경제 파탄뿐이다. 큰 정부의 해악은 단순히 현 경제를 망치는 데 끝나지 않고, 우리 미래 또한 그르치기 십상이다.
저자에 따르면 발전의 논리는 명쾌하다. 바로 자율 경쟁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사유재산이었듯, 시장의 효율을 높여 발전의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최선의 성장 방식인 것이다.
수백년 전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였다. 도나텔로, 보티첼리, 다 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등이 활동했던 피렌체는 예술의 요충지였다. 그러나 당시 도시국가로 피렌체와 쌍벽을 이루던 베네치아엔 걸출한 예술가가 없었다. 나폴리, 밀라노 등 다른 도시와 함께 베네치아는 정부가 예술품 주문을 독점해 창조성이 나올 리 만무했다.
백자 기술도 마찬가지다. 17세기까지 백자 기술은 중국과 조선만 보유했고, 현대 도자기술의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은 17, 18세기에 기술을 익혔다. 임진왜란 당시 다이묘들이 조선 도공을 붙잡아가자 전쟁 후 광해군 시대엔 궁중 연례에 쓸 청화백자 항아리가 없어 전국에 수배할 만큼 도공들이 없었다. 더욱이 조선에서 도공은 실명을 걸고 작업할 수 없는 천민 계층이어서 장인 정신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다이묘들은 차와 도기에 심취해 도공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조선 도공들이 제작한 아리타야키를 수입해 유럽에 팔아 서양인들도 도자기 매력에 빠졌다. 도자기 무역을 통해 일본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지금도 야마구치 현의 하기야키, 가고시마 현의 사쓰마야키 등은 조선 도공과 그 후예들이 구워낸 유명한 도자기들로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병호는 만모한 싱으로 경제 성장이 압축되는 인도, 영국병을 걷어낸 대처의 신자유주의, 아직 독일병에서 허덕이는 큰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 등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자율과 경쟁의 원리와 얼마나 중요한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인간 문명의 요람 아테네를 말하면서도 최고의 발명품 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가 있었지만, 창의성이 꽃 피웠던 시대에 진짜 생산 기술인 농업과 수공업 같은 기술은 발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으로 시민과 노예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은 노예를 부리며 유순하고 게으르게 만들었고 인센티브가 없던 노예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히는 <한국, 번영의 길>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시스템이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의 질서만큼 진리에 가까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이 책도 한계가 있다. 맹점은 성장론자의 그것처럼 거시적인 밑그림 이후의 구체적 해결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극화, 비정규직 등 현안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치가 있는 것은 <번영의 길>에 이르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10년 후 한국은 번영의 길을 걷고 있을지, 책을 읽으며 함께 고민해보자.
덧붙이는 글 | <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해냄, 2005년 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