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황연기 피어오르는 브로모 화산의 분화구. 저 아래 힌두신들이 살고 있다. ⓒ 정철용
유황 연기 내뿜는 신들의 거처, 브로모 화산
겁 많은 아내와 장모님을 빼놓고 장인어른과 나와 아이들은 모두 말에 올라탄다. 뉴질랜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준수한 말이 아니라 조랑말에 가까운 작은 말들이다. 난생 처음 타보는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기수가 옆에서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으니 탈만하다.
| | | 브로모 화산의 전설 | | | |
옛날에 조꼬 세거(Joko Seger)라는 왕과 로로 안텡(Roro Anteng)이라는 왕비가 살고 있었다. 매우 고결한 기품을 지닌 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에게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다. 이에 감동한 신들은 마침내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조건은 막내를 제물로 바치면 많은 자식들을 낳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신들과 약속을 했다.
그 후로 조코와 로로는 많은 자식들을 낳아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은 신들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근심에 빠졌다. 그들은 사랑하는 막내아들 케수마(Kesuma)를 도저히 제물로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참다못한 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온 마을에 재앙을 내리는 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이 사실을 안 케수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브로모 화산의 분화구에 던졌다. 이에 신들은 노여움을 풀었다는 표시로 분화구로부터 거대한 구름을 분출했다.
이후 브로모 화산 주변에 사는 고산족인 텐거족(Tengger, 이 이름은 왕비의 성 Anteng과 왕의 성 Seger의 끝 음절을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마지막 달의 보름날에 과일이나 야채와 꽃 또는 가축 등을 제물로 브로모 화산의 분화구에 던지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것을 야드냐 까사다(Yadnya Kasada)라고 부른다. / 정철용 | | | | |
그 말을 타고 제법 먼 거리의 모래바다를 건넌다. 모래언덕 위, 브로모 화산의 분화구로 오르는 가파른 계단 앞에서 우리는 내린다. 돌아가는 길에 또 말을 타니 나중에 다시 그 앞에서 만나자고 기수는 말한다.
중간 중간에 쉬어가면서 248개의 가파른 계단들을 모두 오르니 유황냄새가 코를 찌른다. 아까 전망대에서 보았던 그 하얀 유황 연기가 잿빛의 분화구 한복판 갈라진 틈에서 솟아나오고 있다. 마지막 분출이 1993년에 있었다고 하니 브로모 화산은 아직 활화산인 셈이다.
계단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앉아 꽃을 팔고 있더니만 계단 끝 꼭대기 위에서도 한 노인이 에델바이스로 만든 꽃다발을 팔고 있다. 그는 분화구를 가리키며 꽃을 집어던지는 시늉을 한다. 유황 연기 피어오르는 화산 꼭대기에서 웬 꽃이람. 그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저 유황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래, 신들의 거처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유황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못 참겠던지 아이들은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조른다. 올라갈 때와는 달리 우리는 계단을 단숨에 내려온다. 계단을 다 내려와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를 태웠던 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등에 태우고 숨을 헉헉거리며 모래언덕을 올라온다.
10살 된 나의 말 바라(Bara)'는 쉴 틈도 없이 다시 나를 태우고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간다. 70kg이 조금 넘는 내 몸무게가 그렇게 무거웠나. '바라'는 연신 방귀를 뀌어댄다. 그 꼴이 우스우면서도 안쓰럽다. 뒤쫓아 오는 딸아이가 내 말이 뀌어대는 방귀 소리에 연신 웃음을 터뜨린다.
'바라'는 아내와 장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 준다. 말에서 내린 나는 '바라'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준다.
"내가 너무 무거웠지? 그래도 잘 참아주었으니 고맙다, 바라야."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된 사원, 자위 사원
7시 40분쯤 호텔로 돌아와 우리는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런데 서양식으로 간단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뷔페식 아침 식사에 빵은 보이는데 우유가 안 보인다. 아이들이 우유를 찾길래 호텔 직원에게 주문을 하였더니 바로 갖다 준다.

▲채 가시지 않은 구름을 배경으로 모래밭 한복판에 서 있는 힌두 사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들어가지 못했다. ⓒ 정철용
가이드의 말로는 이 지역에는 이슬람교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든 힌두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우유를 놓지 않은 것은 그래서일까?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여 숭배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금 전에 다녀온 브로모 화산 아래에서 보았던 힌두 사원을 떠올리며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해 본다.
아직 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넓은 모래바다의 한복판에 신비한 모습으로 서 있던 힌두 사원이 눈에 자꾸 밟힌다. 외부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아쉽게도 우리는 그 힌두 사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년에 단 한 번, 이들의 달력으로 마지막 달의 보름날(보통 10월이나 11월에 해당됨)에 열리는 축제 때에 외부인들에게도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찾아올 것인가.

▲불교와 힌두 양식이 혼합된 사원 간디 자위. 족자카르타에서 보았던 문두트 사원과 비슷하다. ⓒ 정철용
기약 없는 후일을 도모하기보다 우리는 가능한 현재를 선택하기로 한다. 호텔에서 부족한 잠을 보충한 후 바로 공항으로 가는 대신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또 다른 사원을 구경하기로 한 것이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라 기사와 가이드에게 별도의 요금을 더 주기로 하고 우리는 호텔에서 2시간을 쉰 후 출발을 했다.
불교 양식과 힌두 양식이 혼합된 사원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트레테스(Tretes)의 자위 사원(Candi Jawi)은 족자카르타에서 보았던 문두트 사원(Candi Mundut)과 비슷해서 큰 감흥이 들지 않는다.
카르타나가라(Kartanagara) 왕이 다스리던 싱가사리(Singasari) 왕조의 마지막 시기인 13세기 후반에 지어진 사원이라고 한다. 그는 불교와 힌두교는 동일한 종교의 두 측면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이 사원의 석실에 있는 신상(神像)은 반은 시바의 모습으로 나머지 반은 부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신상이 없는 신의 집, 모스크
점심을 먹고 수라바야로 향한다. 도로 양 옆으로 늘어선 집들이 하나같이 낡고 추레하다. 그러다가 가끔씩 번듯하고 화려해 보이는 건물이 눈에 띈다.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다. 인도네시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이 기막힌 부조화가 너무나 불공평해 보여서 가이드에게 묻는다.
“저기 저 집들은 저렇게 낡고 더러운데, 모스크는 왜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짓는가요?”
“모스크는 신들이 사는 집이니까요.”
이슬람교도인 가이드는 내 질문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한다. 그 대답에 나는 할말을 잃는다. 이들은 물질은 가난해도 마음은 결코 가난하지 않구나. 내 질문의 부질없음을 그리고 가이드의 대답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고 나는 부끄러워진다.
반둥 가는 길에서도 보았는데, 여기서도 작은 마을들을 통과하는 비좁은 길의 한가운데에서 돈을 구걸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가이드에게 물으니 자기 마을에 번듯한 모스크를 짓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 직접 마을 주민들이 나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지은 모스크의 내부를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서 가이드에게 부탁을 했더니 수라바야 시내에 있는 한 모스크에 우리를 내려 준다. 자카르타에서도 겉모습만 보았을 뿐이어서 모스크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장식과 으리으리한 규모를 생각했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선 모스크의 내부는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다. 의자도 없는 맨바닥에 아무런 장식도 없는 흰 벽이 너무나 정결하다. 겉보기와는 달리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한 모스크 안에서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몰라 두리번거린다. 그런데 사원이면 으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신상(神像)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이 없는 신의 집이라니! 그렇다면 신은 어디에 사는가?
남자 몇 명이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그 모습이 자못 경건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알아챈다. 신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 있을 것이라고. 기도를 올리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들의 신을 모신 석실일 터이다.
전날 밤에 묵었던 호텔 방에서 발견한 천정의 ‘키블라’ 표시를 새삼스럽게 떠올리며 나는 그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물러 나온다. 가이드와 기사가 시계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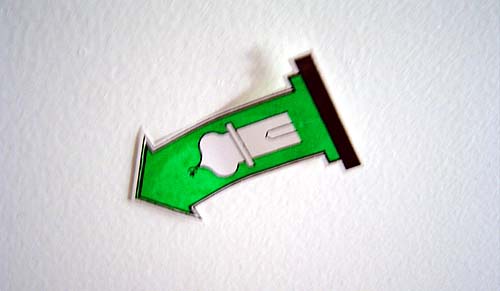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 있는 '키블라' 표시.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기도할 때 신은 기도하는 이의 마음속에 깃든다. ⓒ 정철용
자카르타로 돌아와 처남 집에서 하루를 더 머물고 우리는 오클랜드의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 그리고 반둥과 수라바야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풍경들을 말이다.
우리에게는 고작 1500원에 불과한 10,000루피아를 받고도 너무나 고마워하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고마워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깃들어 있는 신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물질적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운 그 마음일 것이다.